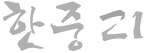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북쪽 이르핀에서 강을 건너 대피하던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촬영하던 전 미국 뉴욕타임스(NYT) 소속 브렌트 르노 기자(51)가 러시아군의 총격에 숨졌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해외 언론인, 특히 미국인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다."
동아일보가 전한 뉴스다. 러시아 전쟁에서 전장 소식을 전하는 미국인 기자가 총에 맞고 숨진 것이다. 비무장 난민에 이어 전쟁의 참혹상을 현장에서 기록하는 기자까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기자란 직업은 참으로 고달픈 직업이다. 사명감이 크고 그에 대한 보람도 크지만 어찌 보면 돈과 권력이 있는 모두가 싫어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전쟁터에서는 러시아 총구 앞에서 러시아에 대한 반전 보도를 해야한다. 결국 그러다 불행한 일을 당하기도 한다. 이번 브렌트 르노 기자 역시 마찬가지다.
평생을 기자로 살아온 이들이라면 르노 기자의 죽음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그의 명복을 빌게 된다. 그가 전쟁터에서 전하고자 했던 것들은 실은 이미 모두가 아는 것이다. 전쟁은 민중을 불행하게 하는 권력자들의 외교수단이다.
총을 든 병사들이 전쟁터에 쓰러져 목숨을 바치지만 전쟁을 치르는 당사국들의 위정자들은 국회의 마이크 뒤에서 목소리만 높일 뿐이다. 그 터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민중을 위해"서다. 정작 민중은 이들의 외교 놀음에 휘말려 전쟁터에서 총칼을 마주하고 싸우다 쓰러져간다. 너무도 불합리한 일이다.
모두가 알지만 그래도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게 민중이다. 마이크는 위정자가 잡고, 총칼은 민중이잡는 수밖에 없다. 르노 기자는 이 모두가 아는 사실을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쓰러져 가는 민중의 모습을, 민중의 목소리를 전하며 다시 일깨우려 했던 것이다.
다시 한번 르노 기자의 명복을 빈다. 로노 기자의 용기에 중국 네티즌들도 명복을 빌고 있다. "찬사를 보낸다"는 문구가 눈에 띈다.

대단한 기록자였어, 그를 향해 찬사를 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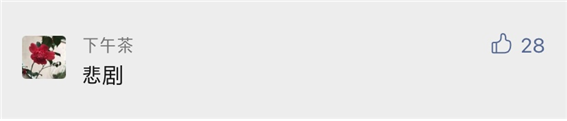
그야말로 비극이야.

용감한 기자여, 편히 쉬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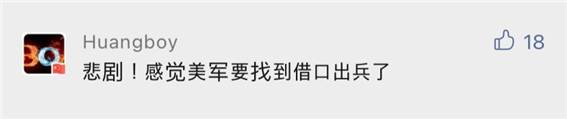
비극적이야! 미군은 이 핑계를 대고 출병할 것 같아.

영웅이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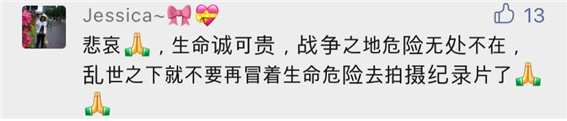
슬퍼, 목숨은 귀하고, 전쟁의 위험은 어디에나 있으니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목숨 걸고 다큐멘터리를 찍지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