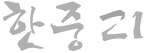삶은 무엇인가? 죽음은 또 무엇인가?
철학의 가장 기본적 질문이다.
두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의 철학과 신학이 시작됐다.
철학은 여전히
사람 속에 답을 찾고
신한은 그 답을
신에게 미뤘을 뿐이다.
생과 사는 그리도 어렵고
난해한 문제다.
한자의 생과 사는
답은 아니지만
그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를 다루는 접근법을 보여준다.
사실 문제는 답이 아니다.
오직 문제가 문제인 것이다.
문제가 뭐냐에
답이 달린 것이다.
한자의 생은 싹이다. 땅에 솟은 새싹이다.
누가 봐도 쉽게 이해하는 상형자다.

죽음은 한편의 동영상이다.
생보다는 복잡한 그림이다.
단상 위 시체를 사람이 지켜보는 모습,
임종의 순간이다.

두터운 땅을 뚫고 솟아난 새싹,
그 여린 새싹이 어이 쉬울까?
땅 속에는 뿌리가 자리 잡고 있다.
싹은 뿌리가 내린 뒤
솟아나는 것이다.
삶이 그렇다. 어찌 뿌리 없는 생이 있으랴.
그래서 생은 외롭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홀로 뿌리를 내리고
두터운 지표를 뚫어야 한다.
새는 껍질을 깨는 노력을,
동물은 자생의 순간까지
수없는 몰생(沒生)의 위험을 겪어야 한다.
삶은 결국 홀로 서는 과정이다.
외로운 일정(日程)이다.
식물의 싹이 생(生)을 대표하게 된 이유다.
삶은 외로운 일정이다.
반면 사(死), 죽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당사자가 몰생(沒生)하면
다 되는 게 아니다.
산 자가 죽은 자를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다.
진정한 죽음은 나만의 몰생(沒生)이 아니라,
나를 지켜보는 산 자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할 때
죽음이 진정 완료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는 건 외로워 힘들고
죽는 건 남는 자 탓에 힘든 것이다.
내가 내 죽음이
슬픈 게 아니다.
내가 죽어 남는 이가 있어,
그 이별이 슬픈 것이다.
죽음은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학이다.
생별(生別)이 사별(死別)이 서로 다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