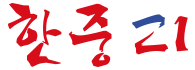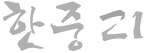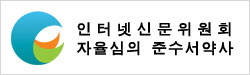![중국전술 36계 (三十六计) 제4계 : 이이 따이라오 (以逸待勞 [yǐ yì dài láo] )는 중국 전한때의 고사에서 나왔다고 전해진다. 바이두 웨이보 캡쳐.](http://www.kochina21.com/data/photos/20201147/art_16058823117306_a9ce84.jpg)
중국전술 36계 (三十六计) 제4계 : 이이 따이라오 (以逸待勞 [yǐ yì dài láo] ) : 여유있게 힘을 비축하며 쓸 때를 기다려라. 서두르다 미리 지치면 진다.
36계 제 4계의 중국 한자 네글자를 문자 그대로 풀자면,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다가, 힘써서 피로해진 적을 상대해라" 는 뜻이다.
으로, 힘과 무력으로 치러야하는 전쟁터에서, 편히 쉬어서 기력이 왕성한 군대가 피로에 지친 적을 물리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일것이다.
서두르면 진다는 말이다. 힘이 안되는데 서두르기만 하면 지쳐서 자멸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욕심만 앞서고 실력을 준비하지 않으면 백전백패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또 현대생활에서 응용해 보자면, 어떤 대결이라도, 욕망을 먼저 보이거나 스스로 조급한 나머지 그목표달성을 위해 서두르면 얻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제 4계의 전략이 나온 중국전쟁의 해당 고사를 살펴보다 보면, 기원전 206년에 유방(劉邦)이 세운 한나라 즉 전한[ (前漢, 또는 서한(西漢)] 때의 고사가 등장한다.
오늘날 현대 중국의 민족이름의 기원이 되는 한(漢)나라는, 전한 [ (前漢, 또는 서한(西漢)] 그리고 후한 [ (後漢, 또는 동한(東漢) ] 두개의 한나라로 나뉜다.
서한은, 삼국지의 세명의 주인공중 한 명인 유방이 한(漢)나라 를 세웠다가 약 215년만인 서기 9년에 왕망의 신(新)나라의 정변에 망하기 전까지를 일컫는 말이다.
동한은, 서한이 망한 이후 16년만인 서기 25년에 신나라에 의해 망한 이전 한나라 왕조의 후예인 유수(劉秀)가 다시 한나라를 세운 한나라를 말한다.
36계 제 4계인 이이 따이라오 (以逸待勞 [yǐ yì dài láo] ) 고사는, 후한으로 다시 한나라를 세운 유수가 전한이 망하기 전에, 전한에 대항했던 군벌들과 벌인 전투에서 승리한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간단히 풀어보자면, 유수는 전한 말기에 각지에서 한나라를 공격하는 깐수(甘肃)성 군벌이 공격해오자 , 샨시(山西)성의 고지에 위치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쉰이 (栒邑 [Xúnyì] 를 휘하장수에게 미리 점령하게 한 뒤 충분히 쉬게 했다.
한편 깐수성 군벌은 전한을 빨리 공격하고 싶은 마음에 고지에 위치한 전략거점인 쉰이성을 점령을 앞두고 병사를 충분히 쉬게 하지 않고 진군을 독려해 쉰이성을 공략했다.
결과는 충분히 쉬면서 적의 공격에 대비했던 유수의 승리로 돌아갔다. 충분히 쉬고 임을 충전했던 유수의 군대가 , 급한 마음에 지친 상태에서 연이어 성을 공략하던 적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 제 4계의 고사는, 특히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의 일상생활이나 비지니스세계에 대입해보면 매우 귀중한 팁을 주는 방책이다.
즉, 담판이나 상담을 위한 회합장소에 미리 나가 여유있게 대비하라는 것이다.
상대에게 요구할 것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또 상대의 요구를 미리 헤아리면서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등등의 전략을 차분하게 정리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다 상대가 약속시간에 맞추느라 허겁지겁 오거나, 늦게 도착해 미안해 할 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과감히 던지면, 상대는 미안한 마음에서 라도 혹은 미리 방비하지 못한 죄?로 , 나의 요구나 청을 받아 줄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약속이나 회합장소에 일찍 나가라.
이는 시간적인 여유도 의미하지만, 다양한 대안을 미리 미리 준비하라는 뜻도 포함한다.
어찌보면 손자병법이라는 게, 무슨 신출귀몰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사는 생활의 기본을 깨우치는 것일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하라' 가 제 4계의 교훈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제 4계의 고사와 관련해서 , 손자병법의 출판시기와 편찬자에 관한 여러 설도 살펴볼 일이다.
손자병법은 기원전 6~5세기경에 있었던 중국 전국 시대의 제(齊)나라 병법가 손자의 이름을 달고 있으나, 당사자인 손자(손무)가 편찬했다 설보다는, 이후 같은 전국시대에 살았던 손빈(孫濱)이 지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설은, 삼국시대의 조조(曹操, 사후에 위무제 (魏武帝)로 추존됐다) 가 편찬했다는 설 또한 유력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제 4계 이이 따이라오 (以逸待勞 [yǐ yì dài láo] ) 고사는, 손자와 손빈이 살았던 기원전 6~5세기경의 전국 시대보다 한참 이후인 기원전 206년부터 서기 9년사이에 존재했던 한나라(서한/전한) 때의 고사이다.
따라서 36계 안에, 이 제 4계 이이 따이라오 (以逸待勞 [yǐ yì dài láo] ) 고사가 들어 있었다는 얘기는, 손자병법의 36계가 전국시대에는 36계로 완비됐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한나라 (전한과 후한을 합해) 가 망하고 나서, 위(魏)ㆍ촉(蜀)ㆍ오 3국이 분립한 시대에(서기 220~280) 누군가, 즉 조조가 편찬했다는 설이 시대적으로는 맞는 듯하다.
그런데 또 중국의 검색엔진 바이두를 찾아보면, 남북조시대 때 하 나 둘 모여진 계책들이 명나라 청나라시대까지 더해지고 수정되면서, 오늘같은 36계 체계를 갖췄다는 설명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36계의 손자병법은 그 편찬 연도도 중요하겠지만, 손자병법 36계 하나 하나의 책략이 모두 현대인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고대부터 현대를 살아오고 있는 우리 인간세상 흥망성쇠 과정의 원인과 결과들을 그대로 담은, 담담한 인간 욕망보고서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