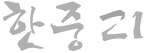정情을 뜻 정이라고 한다. 참 마음에 안 든다.
뜻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 그런데 사실 뜻이나 마음이나? 뭐가 다른가.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동양에서는 연애恋爱라는 게 없었다. 아마 젊은이들은 깜짝 놀랄듯싶다. 그럼 어찌 결혼을 했을까?
연애가 우리 사회에 일반화된 것은 근대화 이후다. 일본 지식인들이 서양에서 수입을 해왔다.
크 아직도 무슨 말인가 싶다.
연애라는 말은 일본에서 서양 기사도에 나타나는 남녀 간 '사랑' 관계를 번역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서양 기사도와 귀부인의 사랑 이야기는 동양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다. 능력 있는 남자가 귀부인과 사랑을 나눈다. 육체적인 사랑이기 보다 서로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사랑이다. 때론 이 사랑을 위해 기사도 귀부인도 각기 목숨을 걸기도 한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어때서?' 하겠지만, 18세기 말 동양에서는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동양에서 남녀 관계는 단순히 딱 두 종류만 있었기 때문이다. 어려서 집안 정해준 부부관계, 혹은 그 밖의 관계? 가 전부다.
부부는 집안에서 서로 맡은 역을 하고, 남자는 더 필요(?) 하거나 능력이 있으면 첩을 얻으면 됐다.
동양을 대표해 서구 문화를 받아들였던 당시 일본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마음으로 그리는 정情이 있었지만, 정은 서구의 남녀 관계와는 어딘가 맞지 않았다. 그렇다고 애爱라고 하기에 애라는 것은 남녀 간의 관계만 지칭하는 게 아니었다. 그래 굳이 찾아낸 게 련恋이라는 단어다.
문제는 련이라는 단어가 당시 일본에서는 지나치게 육욕에 관련된 의미가 있었다고 한다. 결국 련과 애를 합쳐 연애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남녀가 만나 정분이 나는 게 이제 '연애'가 된 것이다.
그런데 '연애'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니 정분이 난다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다. 동양에서는 정분은 같이 지내다 보면 생기는 감정이지, 첫눈에 불붙는 연애 감정과는 좀 거리가 있다.

정은 좋은 감정이 쌓이고 쌓여 생기는 거다. 좋아하는 마음의 누적치다. 쌓인 정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이젠 어쩔 수가 없다. 뜨거웠던 첫사랑도 10년 부부의 정분을 넘지 못하는 이치다. 사실 첫사랑이 뜨거웠던 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
정을 나눈 사람은 일생에 반드시 생기게 마련이다. 그 정을 어디에 비견할까? 부부의 정이란 게 그렇다.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었다"라는 말이 정답이다.
이 바다 저 달은
세상 저 끝도 비추겠지.
서러운 연인이 님 생각에
긴 밤을 홀로 세니
스러진 촛불 아래
겉옷만 어느새 촉촉
이 마음을 어찌 전할까?
다시 꿈속 그대나 찾을 뿐.
참 좋아하는 장구령의 시(원문 보러가기)다. 하루도 그리움에 묻혀 깨어있지 못하는 정인의 마음이다. 같이 살면서 쌓은 정이 묻어난다. 서양식 연애로 이런 시가 나올까?
글쎄? 서양의 연애는 문뜩 생각나게 할 뿐 아닐까? 지나간 청춘의 기억처럼 묻혀 있다 가끔 되살아나 아련할 뿐이 아닐까?
동양의 정은 너무 쌓인 게 많아 말로 하기 힘들다.
情發於中, 言無所擇
정발어중, 언무소택;
마음에 정이 일면 말이 못 따른다.
소동파의 말이다. 그래서 정이다. 항상 붉은 마음이다.

소동파의 말을 되새겨 보니 문득 요즘 소위 'SNS'가 생각난다. 요즘 SNS가 소동파의 말처럼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에서 글로, 글에서 이모티콘으로, 동영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SNS는 과연 정을 쌓아가게 하는 걸까?"
다시 한번 글쎄? 다. 정이란 만나 같이 지내면서 쌓은 것인데, 마음 마음이 쌓여 생기는 것인데, SNS가 그런가? 오히려 한때 연애 감정에 머물도록 돕는 게 아닐까? 아니 그나마 그렇다면 다행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