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고프냐? 이제 배부를 있겠구나.” 노자의 말이다. 무슨 말인가 싶다. 배 고프다는데, 그럼 이제 배부를 수 있다니? 하지만 생각해보라. 배 부른 이가 어찌 배 부를 수 있겠는가? 배 고픈 이가 어찌 배 고플 수 있겠는가? 배가 부르려면, 먼저 배가 고파야 하고, 배가 고프려면, 먼저 배가 불러야 하는 법이다. 이제 생각하니 너무 당연한 말이다. 노자의 진리다. 세상의 쉽고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바로 노자의 진리들이다. 도덕경 2장의 이야기를 위한 몸풀기다.. “天下皆知美之为美,斯恶已;皆知善之为善,斯不善已。” (천하개지미지위미, 사악이; 개지선지위선, 사부선이.) “천하가 안다. 아름다워지려는 것은 아름다움이 추하기 때문이며, 착해지려 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이다.” 착해지려는 게 악해서 그렇다니? 마치 착해지려 애쓰지 말라는 소리로 들린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배 고픔과 배 부름을 생각하면 답이 있다.

자본을 쌓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자린고비' 정신이다. 무엇이든 아껴서 모아야, 그게 쌓이면 자본이 되는 것이다. 굳이 자본주의가 아니더라도, 재물을 쌓는 원리는 유교의 경전 가운데 하나인 '대학'에서도 나온다. '대학'은 나라가 부국이 되는 길을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生之者众,食之者寡“ (생지자중, 식지자과: 생산하는 이가 많고, 소비자가 적으면 재물이 쌓인다.) 하지만 재물의 도리는 버는 도리만 있는 게 아니다. 아끼는 것도 도리가 있다. 이 도리를 모르면 아끼는 게 고통스럽기만 할 뿐이요, 아낀다고 자본이 쌓이는 것이 아니다. 중국 옛 이야기는 배거(裴璩)라는 자리고비면서 악독한 관리가 나온다. 이 관리는 보기 좋은 가구만 보면 탐을 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매번 좋은 가구만 보면 사들였다. 하지만 한 번 산 가구는 아까워서 쓰지를 못했다. 매번 제대로 포장을 뜯지도 않았고 집 한귀퉁이에 쌓아 놓기만 했다. 그러다가 꼭 가구를 써야할 순간이 오면, 그 때는 어땠을까? 이 관리는 그래도 가구를 쓰지 못했다. 권력을 활용해 주변의 중고품을 빌려서 쓰곤 했다. 자신의 새 가구는 아까워서 쓰지 못하고 남이 쓰던 것을 쓴 것이다. 하지만 이 관료가 모르는

“道可道,非常道;名可名,非常名。无,名天地之始;有,名万物之母。”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 명천지지시; 유, 명만물지모) “도를 네가 정의하면 비상의 도요; 이름을 붙이는 순간 비상의 이름이 된다. 없음은 천지 시작의 이름이요, 있음은 만물 시작의 이름이다.” 묘한 말이다. 알려주고 싶지 않은 듯싶다. 마치 이리 말하는 듯싶다. “왜 알려고 하는가? 말하면 알아듣기는 하는가? 그럼 한 번 들어는 봐라.” 그리고 입을 땐다. “도를 네가 정의하는 순간, 그 도는 상(常)도가 아닌, 비상(非常)의 도다. 마치 인간들 사이의 네가 네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다른 인간과 구분돼 네가 되는 것과 같다. 이름이 있는 너는 너이지, 일반의 인간이 아니다. 하물며 그 것은 인간의 말일뿐이다. 보라, 인간에게 산은 산은데, 새에게도 산은 산이던가? 인간에게 강은 강인데, 물고기에게도 강은 강일까? 만물을 존재케한 게 만물의 도인데, 왜 너만 부르려 하는가. 네가 정의한 도는 너만의 도이지, 모두의 도가 아니다. 비상의 도인 것이다.” 천지만물 속에 인간이 있고, 인간 속에 나와 네가 있다. 유(有)와 무(無)도 마찬가지다. 나 아(我)와 비아(非我)가 그렇다.

"草木本有心,何求美人折。" (초목본유심, 하구미인절) "잡초라고 원하는 게 없을까? 어찌 굳이 미인만 기다릴까?" 장구령의 감우 1수다. 감우는 느낌 감, 만날 우를 합친 단어다. 감성을 만나다로 읽어도 좋고, 만나 느낀 감성이라 해도 좋다. 둘 다 시인의 시의에 부합한다. 소개한 싯구는 당 시인 장구령의 감우 1수 가운데 마지막 구절이다. 시인은 생활 속에 만난 작은 사물을 보며 느낀 자신의 감성을 엮어서 시로 만들었다. 당시 300수의 수작 중 수작이다. 장구령(張九齡, 678년 - 740년)은 중국 광둥성 소주 출신으로 중국 당나라 중기의 유명한 시인이자 정치가다. 당 현종 치세에서 정치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큰 업적을 쌓았다. 오늘날 총리격인 중서령을 역임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한다. "蘭葉春葳蕤,桂華秋皎潔。" (난엽춘위유, 규화추교결) "난초 잎은 봄에 풍성하고 계화 꽃은 가을에 맑은 법" 봄의 아름다움과 가을의 수려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시는 시작한다. 봄과 가을은 흔히 한 해다. 한 해 계절을 보라, 어느 한 계절 아름답지 않은 날이 있던가? 시인 장구령은 위의 말을 이렇게 썼다. "欣欣此生意,自爾爲佳節。" (흔흔차생의, 자이위가절) "모두가 무럭

편집자 주: 본 시리즈 '노자심득'은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이야기다. 노자는 유가의 공자도, 도가의 장자도 스승으로 여겼던 이다. 세상에 딱 한 권의 책 도덕경을 남겼다. 5000자의 도덕경은 총 81개의 장으로, 37장까지를 도경, 44장을 덕경이라고 한다. 노자는 이 도덕경을 통해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의 원리가 있음을 제시하고, 그 원리를 따르라 권한다. 원리를 따르면 흥하고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 한다. 하지만 묘한 게 그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노자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것을 네가 안다 하는 순간, 그 도는 무엇인가 변질된 도라고 한다. 묘한 말이지만,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노자의 생각에 공감을 하게 된다. 노자가 말하는 원칙 앞에서 스스로를 숙이게 되고, 순응하게 된다. 이에 수천년 장구한 동양의 역사에서 도덕경은 이 원칙, 천지창조의 진리로 인도하는 비서(秘籍)로 여겨졌다. 하지만 그 난해한 문구 탓에 아쉽게도 오늘날, 특히 한국에서 노자는 잊혀가는 인물, 도덕경은 잊혀져 가는 책이 됐다. 많은 이들이 도덕경을 읽은 현인이 남긴 말에는 감탄하면서 정작 노자의 말은 읽지 않는다. 이번 시리즈는 이에 노자의 생각, 노자에 대한 집필자의 생각

강함은 남을 이겨야 비로소 안다. 권위 수준은 내 말을 듣는 남의 태도에 달려 있다. 그럼 총명함은 어찌 아는가? 남의 우둔함을 보고 비로서 안다. 남의 잘못이 보이고 고칠 수 있을 때 비로소 총명함을 안다. 그럼 다시 부유함은 어찌 아는가? 마찬가지다. 남의 재산을 보고 안다. 남보다 많으면 스스로 부유하다 한다. 하지만 이 것들이 정답인가? 정말 아는 것인가? 정말 강한 것인가? 정말 총명한가? 정말 부유한가? 남을 통해야 비로서 아는 게 정말 아는 것인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비교의 남이 바뀌면, 답도 바뀌는 게 정말 정답인 것인가? 그럼 왜? 내가 강한데,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고, 내가 총명한데 왜? 나보다 더 총명한 사람이 있는가. 또 그럼 왜 내가 부유한데 항상 나 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가. 그 앞에 왜 나는 항상 모자라기만 한 것인가? 도대체 어찌해야, 진정 강함을 알고, 어찌해야, 진정 총명함을 알고, 어찌해야, 진정 뜻이 있음을 알까? 또 어찌해야, 내가 진정 부유함을 알까? 동방의 성인 노자는 ‘내 자신에서 알라’ 했다. 남을 이기는 자는 그저 힘이 있는 자요, 진정한 강함은 스스로를 이기는 데 있다 했다. 남을 아는 이는 지혜

의(意), 뜻이다. 마음 위에 있는 소리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소리다. 끝없이 들리는 마음의 소리다. 내 마음 속의 소리가 들리면, 수없이 끊임없이 들린다. 저절로 행하게 된다. 마음의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그치지 않는 마음의 소리, 그 것이 바로 뜻이다. 의지(意志)다. 한자 의지는 다른 것이 아니다. 마음의 소리가 끊임없는 게 의(意)이고, 그 마음의 소리가 변치 않는 게 지(志)다. 의지란 마음 속 수많은 소리의 파편들이 하나가 되고, 그 것이 머물러 변치 않을 때 의지가 되는것이다. 순 우리말 그대로, 앞의 의도 뜻이요, 뒤의 지도 뜻이다. 의지란 그런 것이다. 마음 속 소리의 파편들이 하나로 형체를 이루고 머무는 것이다. 그 의지는 오래될수록 빛이 난다. 세월의 풍파와 마연(磨硏)으로 만들어지는 빛이다. 그런 의지는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기억의 억(億)은 그런 생각을 담았다. 억은 소전(小篆)에 그 모습이 보인다. 개인적으로 봐도 갑골문에서 보이기에는 뜻이 너무 섬세하다. 사람 인 옆에 뜻 의가 있는 모양이다. 지금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사람 인의 모양과 뜻 의의 모양이 현대화 됐을 뿐이다.

한자 명상이 던지는 난센스 퀴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글자는 무엇일까? "생각 사(思)다." 어렵다면 어렵고, 엉뚱하다면 엉뚱하다. 말 그대로 생각하기 나름이다. 생각이란 게 본래 그렇다. 생각은 마음의 소리를 내기 전에 생기는 것들이다. 작은 물방울의 수를 세기 어렵듯 생각 역시 셀 수 없다. 작은 물방울이 그렇듯 홀연히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불현 듯 솟아난다. 생각이다. 생각은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다. 고 신윤복 선생의 평이다. 생각은 이성적 머리와 감성적 가슴 사이를 채우는 것인데, 그 둘 사이 차이가 그리 넓고 크다는 것이다. 사실 생각 사(思) 본래의 뜻이 머리와 가슴이다. 생각이라는 한자는 금문도 없고 전서에서 등장을 한다. 전국시대 들어 생각이라는 한자가 만들어져 쓰였다는 의미다. 마음의 소리인 뜻 의(意)자 있어, 생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그 뒤 마음의 소리가 의지의 뜻으로 쓰이면서 다른 마음의 잡음들을 뜻하는 한자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오해를 사지 않으려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게 있다. 필자는 학자가 아니어서 학문적 검증을 통해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그저 자료를 통해 얻은 생각들을 공유하고자 이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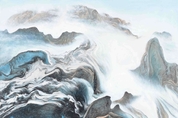
有無相生, 難易相成, 長短相形, 高下相盈, 音聲相和, 前後相隨, 恒也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상형, 고하상영, 음성상화, 전후상수, 항야) 노자의 가르침이다. 세상은 조화다. 차가움이 있기에 따뜻함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 생명은 물체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서 나온다. 이룸이란 쉽고 어려움이 뒤섞인 것이다. 한 가지 높이, 한 가지 색으로만 모양을 만들 수 없다. 낮은 게 있어 높은 게 돋보인다. 바탕이 있어 위에 놓이는 색이 도드라지는 것이다. 값이 정해진 소리만으로 노래가 나오지 않는다. 음과 음을 이어가는 소리, 때론 떨림의 소리가 있어 노래가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내가 뒤에 서지 않으면 내 앞에 서는 이도 없다. 네가 내 뒤를 따르지 않으면 내가 앞에서는 일도 없다. 따름이란 누군가가 앞서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누구가가 따르기에 전후가 있는 것이다. 조화가 바로 아름다움이다. 영원한 것이다. 반대로 유나 무만 있으면 생명이 없고, 쉬움이나 어려움만 있으면 이룸이란 있을 수 없다. 긴 것만 있고 짧은 것만 있으면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 높음만 있고, 낮음만 있으면 어찌 충일이 나오겠는가? 음만 있고, 바이브레이션만 있으면 노래가 아

一片丹心 한 사람이 평생을 산을 좋아했다. 정상에 오르면 돌을 하나씩 쌓았다. 작은 기도와 함께 그렇게 돌에 돌을 하나씩 얹었다. ‘오늘도 이렇게 산을 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게 해주세요.’ 작고 평범한 기도였다. 때론 행복을, 때론 건강을, 때론 자신을, 때론 가족을, 지인을 위한 것이었다. 작은 돌은 그렇게 또 다른 작은 돌 위에 쌓였다. 쓰러지지 않게 조심스레 놓았을 뿐이다. 일 년이 지나 돌은 돌 위에 조금씩 자라 키가 커졌다. 탑이 됐다. 탑 모양이 되자 탑은 저절로 자라기 시작했다. 산이 좋아 산에 오른 사람들이 탑을 보고 하나둘씩 돌을 얹기 시작한 것이다. 돌탑은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았다. 허술해 보이는 수많은 작은 구멍 덕이었다. 구멍 덕에 돌탑은 바람에 저항하지 않을 수 있었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수십 년이 지나 처음 돌을 얹은 이는 이제 더 이상 산을 오르지 못했다. 그런데도 탑은 더 자랐다. 탑 옆에 아들, 딸 탑도 생겼다. 탑 가족이 됐다. 산이 좋아 오른 이들의 작은 마음 한 조각이 그렇게 돌로 탑이 됐고, 탑의 가족이 됐다. ‘누구의 뜻이 이리 간곡한가.’ 매번 산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