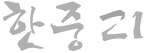쓸모 있다는 것만큼 현대에서 존중받는 가치도 드물다. 반대로 "어디다 쓰니?", "쓸모없는 놈" 같이 심한 욕도 없다.
그런데 과연 '쓸모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쓸모에 대해 고민해왔다. 대표적인 화두가 노자의 '當無有用'(당무 유용)이다.
통이 채워져 있으면 수레바퀴로 쓸 수 없고, 통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것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흙으로 그릇을 빚어 쓸모가 있는 것은
그것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어 있기 때문에 쓸모가 있다고 한다. 사실 쓸모의 용자에는 일찌감치 이 화두가 담겨 있었다.
갑골문의 용자는 나무로 만든 물통의 상형자다.

용 자의 가운데 작대기는 물통의 뚜껑을 의미한다.
개인적으로는 우물의 지렛대 두레박 모양이라고 생각한다. 솟을 용(甬) 자와 같은 자인데 쓸 용자의 의미가 쓰다는 뜻으로 고착되면서 쓸모라는 뜻으로 쓰이게 됐다는 게 학자들의 분석이다. 그리고 쓰다, 쓸모 등의 뜻으로 用 자가 쓰이면서 나무 통이라는 뜻의 한자 인
통(桶) 자를 만들었다고 학자들은 본다.
언제나 그렇지만 그 옛날 한자를 만든 선인들의 순박한 지혜에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쓸모라는 게 글자 자체가 물을 담는 통이었다니 …. 물통이 필요한 것은 물 때문이다. 물을 들어 올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물통을 쓰려면 그 속에 다른 것이 채워져 있으면 안 된다. 정말 시원한 물처럼 시원한 해석이다. 당무 유용처럼 고담준론도 아니다. 그러면서도 더 명쾌하고 분명하다.
쓸모란 그 목적하는 데 쓰이는 것이다.
그 속이 비어 있어야 쓸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당무 유용을 '있다'를 동사로 해석하지만, 개인적으로 '쓰다'를 동사로 해석한다.
많은 이들이 '쓸모가 있다'라고 해석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있는 곳을 쓴다'라고 해석한다. '당무'하면 '유용'이라 읽는 게 아니라, '당 우유'를 '용'한다고 읽는다. 즉 "무에 당면해 있는 유를 쓴다"라고 읽는다.
당무유를 용한다 하지 않고 당무에 유용한다고 읽어도 그 차이는 작다. 그러나 치명적이다.
가장 큰 문제가 '빈 곳'에 쓸모가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당무위를 용한다고 읽으면 여전히 쓰는 것은 유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유'다. 있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을 쓰는 것이다. 나무 통이 쓰이다는 뜻을 가지게 된 이유다.
그럼 빈 곳은 무엇일까? 담기는 물이다. 쓰임의 목적이다. 본래 쓰임이라는 게 목적이 생기고 나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다. 쓰고자 하는 것이 정해져야 있는 곳을 쓰는 일이 생긴다.
사실 요즘 들어 이 화두는 좀 더 복잡해진다. 우리는 속이 가득 찬 컴퓨터를 쓰는데, 그 쓸모가 다양하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 있는가? 어느 빈곳을 채우기 위해 어떤 있는 것을 쓰기는 알기는 하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생긴다.
무유无有와 같이 생각해볼 말이 허실虚实이다. 같은 구조의 단어다. 개별적인 뜻도 같다. 때론 '당허실유'当虚实有'라는 말을 생각해본다. 실재라는 것도 공허함이 있어야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허는 미래의 비전이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러나 뜬구름 잡는 비전 없이는 현실의 계획도 있을 수 없다.
결국 꿈꾸는 사람이 가장 현실적인 사람인 것이다. 삶 자체가 유용한 데 그것은 죽음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이르러 '진인'(眞人; 참된 인간)이 되는지 모른다.
그것도 또한 역으로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 옛말에 모든 인간은 살면서 다르지만 죽으면서 같아진다 하는 것이다.



 © jenandjoon, 출처 Unsplash
© jenandjoon, 출처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