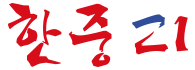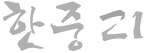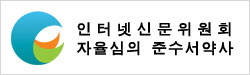4. 중국의 금보유, 미중 화폐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미국 채권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채권 시장이다. 전 세계 정부와 중앙 은행은 이 시장에 대한 투자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시장은 중국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클 뿐만 아니라 다른 초안전 투자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현재 4.58%인 반면, 독일과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각각 2.36%와 1.09%입니다.
중국의 보유 자산 축소로 한때 미국 국채의 최대 해외 채권국이었던 일본(1조1000억 달러)에 자리를 내줬고, 이는 3위인 영국(7162억 달러)에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채권의 최대 매수자는 국내 기관과 개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보험 회사 및 연기금과 같은 대형 금융 기관은 일반적으로 자산 배분의 일부로 많은 양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도 중요한 보유자로, 2019년 말 기준 2조 6,40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채권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5조 4,0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전염병이 완화된 후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여전히 4조 9,400억 달러입니다.
반면, 중국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금을 매입하기 시작한 시점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PBOC의 금 보유량은 2022년 첫 10개월 동안 1,948t으로 변동이 없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제한이 완화된 달인 11월까지 보유량을 1,980톤으로 늘리기 시작했고 12월에는 2,010톤으로 계속 보유량을 늘렸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량은 2,237톤으로 증가했습니다. 2024년에는 12월에 2,271톤으로 보유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24개월 동안 금 보유량을 16.6% 증가시켰다는 의미다.
중국의 실제 매입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이며, 일부 연구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스텔스 매입을 통해 은밀히 보유고를 늘렸다고 보고 있다.
귀금속 시장에 초점을 맞춘 기관인 머니메탈익스체인지(Money Metals Exchange)의 분석가인 얀 뉴웬후이스는 중국 중앙은행이 런던의 금괴 은행을 통해 비밀리에 금을 매입하고 있으며, 이렇게 구매된 금은 보통 400온스 금괴 형태로 영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실제 영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 중국 중앙은행은 53톤의 금을 매입했지만, 이러한 거래는 통계적으로 '비화폐' 금으로 분류되어 중앙은행의 완전 매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다. 이 전략을 통해 중국 인민은행은 시장에 과잉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금 보유량을 계속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쉬톈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중국이 준비자산을 다각화하려는 노력도 이러한 결과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스텔스 구매를 통한 매장량 증가에 대해 쉬톈첸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믿는다.
중국이 이렇게 은밀히 구매에 나서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공개 구매를 통해 시장 금 가격을 밀어 올리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꾸준한 속도로 금 보유량을 늘릴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어 중국 인민은행은 금 보유량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외환관리 수단을 100%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격동의 시기에 외환관리가 지나치게 투명해서는 국가의 자산운용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무엇보다 미국에 의한 자본시장 불안을 최대한 경계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미국은 자국내 발생한 불안을 해외로 돌리면서 해결하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위원인 위융딩은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질서 있게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감축이 단순한 매도세가 아니라 미국의 해외 순부채 악화와 '달러 무기화'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미국 채권 보유량 축소는 당장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계량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도할 때 수익률에 일정 부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매도세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할 때 그 영향은 충격이라고 할 정도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미국채 보유 축소 조치는 미국 국채시장에 어느 정도 취약점을 안겨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금 보유 증가세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24개월 동안 중국의 금 보유량 증가 속도가 불균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 6개월은 "정체"되었고 당선 다음 달에는 "플러스" 모델이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외환 정보 웹사이트 "FXEmpire"의 시장 분석가인 블라디미르 체르노프는 트럼프 당선 이후 촉발될 수 있는 무역 갈등 위험이 중국 인민은행의 금 매입 재개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매파적 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잠재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공격적인 금 보유 전략을 채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 부채를 줄이고 금을 늘렸지만 여전히 경상수지를 통해 많은 달러 수입을 얻고 있으며, 중국도 달러를 사용해 BRI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중국의 탈달러화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이 한 일이라곤 다양한 자산군에 걸쳐 투자를 다각화하고 벨기에와 룩셈부르크와 같은 제3국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투자를 관리하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위험을 분산한 것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 같은 균형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무역전으로 급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한 현 글로벌 경제 시스템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이 있는 한 가능하냐는 회의론이 유럽에서도조차 고개를 쳐들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급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