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상에 어느 생물이 혼자 살 수 있더냐? 햇볕없이 수분 없이 피는 꽃이 있더냐? 어느 식물이 양분 없이 자라며 어느 동물이 먹지 않고 살던가? 세상에 홀로 사는 생물은 없다. 먹이가 있어야 살고, 내가 먹이가 돼야 또 다른 생물을 살린다. 그게 자연이요, 그게 '우리'다. '우리'는 무엇인가? '나와 너' 우리 속 나는 언제나 하나지만, 우리 속 너는 둘도 셋도 백도 천도 만도 된다. 우리는 항상 홀로인 나와 복수인 너로 구성되는 것이다. '나 + 너 + 너 + 너 …' 바로 우리의 산식이다. 약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나 + 너희들'이다. 여기서 나를 빼면 '너희들'만 남는다. 너희는 우리의 상대어다. 우리가 너희가 되는 것은 우리에서 '나'를 뺐을 때다. 우리에서 '너희'를 뺀 것이 아니라, 우리에서 '나'를 뺄 때 나는 너희와 다른 '내'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 '나 홀로' 사는 게 있더냐? 내가 있어 너가 살고, 너가 있어 내가 사는 게 바로 우리다.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만이 생명을 유지하는 '합'이요, 자연인 것이다. 우리 속 내가 너를 위해 살고, 우리 속 네가 나를 위해 살 때 우리는 생명을 잇는다. 서로가 변(變)을 초래하고 화(化)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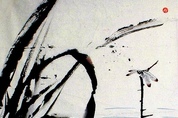
목표의 50점 이상이면 성공인 게다. 서청(徐淸)하며, 서생(徐生)하라! 천천히 맑아지며, 느리게 살아가라. 생이 짧다. 하지만 서둘지 마라. 서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어려운 것을 피하고 쉬운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다보면, 반드시 도달하게 된다. 설사 목적지는 아니어도 원했던 곳에 이르는 그 길 위 어딘가에 반드시 다다르게 된다. 그게 성공 아닌가? 묘한 게 화초다. 잎이 항상 빛을 향한다. 그런데 언제 움직였지? 그래서 화분을 돌려본다. 하루가 지나고 어느새 잎은 다시 햇볕을 향해 있다. 하루 종일 잎을 봐도, 잎이 언제 움직였는지 알 길이 없다. 바람은 잎을 흔들 순 있어도 햇볕처럼 잎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한다. 하지만 어찌 흔들리지 않는 잎이 방향을 바꾸랴. 흔들림은 변(變)이요, 전전(輾轉)은 화(化)다. 변화의 묘미다. 순기자연(顺其自然)의 도리다. 변화는 필연이다. 원하든, 않든 일어난다. 사람, 자연 구성물 모두는 변의 요소다. 스스로 원해서 변하기도 하지만, 옆의 변에 연쇄작용으로 변을 초래 당하기도 한다. 결국 모두가 변과 화를 한다. 의(意)로 변(變)을 추구하지만 뜻대로 되는 변의 결과, 화는 뜻대로 되지 않기 일쑤다. 변(變)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들리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잡히지 않으면 없는 것인가? 우린 살면서 안다. 내가 보지 못해도 존재하는 게 있고 내가 듣지 못해도 존재하는 게 있으며 내가 잡지 못해도 존재하는 게 있다는 걸. 그걸 인정하는 순간 스스로 작음을 깨닫는다. ‘나의 세상’은 비록 내가 중심이지만 내가 없으면 ‘나의 세상’도 존재할 수 없지만 그 세상은 내 뜻으로 존재하지도 움직이지도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나의 세상’을 움직이는 그 무엇인가는 ‘나의 세상 밖의 세상’도 존재하며, 움직인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 삶은 그렇게 그 무엇인가를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하며, 삶은 그렇게 그 무엇인가를 따른다는 것을. 우리 삶은 규율하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만질 수 없는 그 존재야말로 우리 모두가 아는 참된 ‘진리’다. 보이지 않아 묘사할 수 없고 들리지 않아 말할 수 없으며 잡히지 않아 데려올 수 없는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는 ‘참’이다. 그래서 “执古之道,以御今之有,能知古始,是谓道纪。”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능지고시, 시위도기.) “옛 도로 현존을 제어하며, 능히 옛 시작을 아는 것을 도기

‘총애를 받는다’는 게 무엇인가? 신뢰, 믿음을 얻는 것이다. 옛날엔 군왕에게 중용되는 것이요, 요즘엔 민심을 얻어 득표를 하는 것이다. 총애의 반대가 무엇인가? 총애를 잃는 것, 욕(辱)을 보는 것이다. 옛날엔 삭탈관직이요, 오늘엔 낙선, 파면파직이다. 총애는 얻으면 기쁘고 욕을 보면 분하고 슬프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렇다. 인지상정이다. 기쁘건 슬프건 분노가 치밀건 사실 이유는 모두 한 가지다. 자신(自身)의 욕망 탓이다. 잘 했다 평가 받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이다. 총애를 얻거나 욕을 먹어서 받는 기쁨, 분노의 크기는 그런 자신의 욕망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다. 욕망이 없다면 어찌 기쁘고 어찌 슬플까? 어찌 분노하겠는가? 하지만 대업(大業)은 스스로 욕망(慾望)을 버리고 자신(自身)을 희생해 모든 걸 쏟아야 이루는 법이다. 그런 이가 어찌 총애를 얻었다고 기뻐만 하며 어찌 총애를 잃었다고 분노만 하랴.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그런 이가 나랏일을 해야만 하고, 그런 이에게 나랏일을 맡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故贵以身为天下,若可寄天下;爱以身为天下,若可托天下” (고귀이신위천하, 즉가기

성공하고 싶은가? 세상에 없는 성공을 하고 싶은가? 그럼 그런 생각을 버려라. 세상에 없는 그런 성공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성공만이 성공이 아니다. 쉬운 성공도 성공은 성공이다. 성공은 쉬운 일을 할 때 쉽다. 그리고 그 쉬운 성공이 쌓일 때, 비로소 세상에 없는 성공을 할 가능성도 커진다. 성공의 화려함에 눈멀지 말고 성공의 요란함에 귀먹지 말며 성공의 달콤함에 취하지 않으며 그저 쉬운 성공을 하나 둘씩 이루어 가면 큰 성공에 다다른다. 마치 작은 물방울들이 옹달샘을 채우고 냇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어 바다로 흐르듯 작고 쉬운 성공들이 마침내 큰 강으로, 바다로 간다. 그런데 큰 성공의 화려함은 눈을 멀게 하고 큰 성공의 요란함은 귀를 먹게 하며 큰 성공의 달콤함에 사람은 취하고 만다. 그래서 노자는 말한다: “얻기 어려운 것이 이룸을 방해한다. 그래서 성인들이 눈보다 배를 채우는 것을 중시한 것이다.” (难得之货,令人行妨。是以圣人为腹不为目) 성공의 지름길은 꾸준히 가는 것이다. 돌아가든 바로가든 그저 갈 길을 가는 것이다.

“有之以為利,无之以為用”(유지이위리, 무지이위용) “있음은 이롭고 없음은 쓰인다.” 컵을 만들면 우린 빈곳에 물을 채운다. 컵의 벽이 있어 빈 곳이 생기고 빈 곳이 있어야 채워 쓸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컵의 빈 곳을 팔수도 살수도 없다. 빈 곳을 가지려면 컵을 가져야만 한다. 결국 컵의 있음과 컵의 없음은 하나인 것이다. 유와 무가 함께 컵을 이룬다. 이익과 쓰임이 하나인 것이다. 단순하지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다. 사물이나 사람이 왜 이로운 지 왜 쓸모가 있는지 사물의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그 사물의 쓸모를 알 수 있고 사람의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그 사람의 쓸모를 아는 것이다.

세 치 혀를 위해 먹는가? 대략 9m다. 입에서 항문까지의 길이다. 음식이 들어가 맛을 느끼고, 다시 소화가 돼 영양분을 몸에 흡수하는 길이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가 대장으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우린 무엇을 위해 먹는가? 대부분이 세치 혀를 위해 먹는다. 맛있어야 먹고 즐기려 먹는다. 세치 혀가 맛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에 좋은 건 세치 혀가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길고 긴 위장, 소장, 대장에 좋은 것이다. 건강은 세치 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비로소 얻는다. 화려한 색(色)도 화려한 음(音)도 모두 마찬가지다. 진짜 들어야할 것을 진짜 봐야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 오늘날 숏폼도 다르지 않다. 다채롭고 화려한 5분의 볼거리를 위해 아니 요즘은 1분을 위해 우리는 1시간을, 반나절을 결국 인생을 소비한다. 소비가 아니다. 낭비다. 세치 혀를 위해 먹는 것은 음식의 낭비요, 1분의 볼거리에 빠져드는 것은 인생의 시간 낭비다. 그래서 “五色令人目盲, 五音令人耳聾”(오색영인목망, 오음영인이농) “오음이 눈멀게 하고 오음이 귀먹게 한다.” 한다 하는 것이다.

있어야 쓰는가? 맞지만 정확하게 있어서 빈 곳을 쓴다. 물컵은 어디에 쓰는가? 물을 담을 때 쓴다. 빈 곳에 물을 채워 쓰는 게 컵이다. 컵의 쓰임은 모양에 있지 않다. 컵의 빈 곳 크기에 있다. 큰 컵은 모양이 큰 게 아니라 빈 곳 크기가 큰 것이고, 모양만 크고 물을 담을 빈 곳이 작으면 쓸모가 적다하는 것이다. 주먹은 쥐면 남을 때릴 때 쓰고 피면 물건을 잡을 쓴다. 남을 때리면 적이 생기고 남을 잡으면 친구가 생긴다. 빈 곳과 빈 곳을 채우면 이음이 생기고 이어지면 새로운 쓰임이 생긴다. 바퀴살이 가운데를 비워 축과 이어지고 동력을 받아 구를 수 있는 것이다. 빈 곳을 가진 흙이 그릇이 되듯 비워진 주먹이 악수를 가는 것이다. 오늘날 플랫폼이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의 빈 곳을 채워 이어주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질 때 새로운 쓰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있는 유에서 없는 무를 찾으며 쓰임이 생기는 법이다. 그래서 ‘當無有用’(당무유용) “빈 곳에 쓰임이 있다.” 한 것이다.

- 욕망과 욕심은 인간의 본심이다. 살아가는 이유다. 그 걸 버리면 과연 인간인가? 인간이길 포기하고 무슨 수양을 할까? 인간이 인간다운 게 그게 자연인 것을... 노자는 욕망이 나쁘다 하지 않는다. 다스리라 가르친다. - 편집자 주 “持而盈之 不如其已”(지이영지 불여기이) “쥐고 잡으려느냐? 그냥 있는 게 낫다.” 잡고 싶으냐? 그럼 먼저 잡은 것을 놓아라. 잡는 것은 펴고서 하는 것이지 쥐고서 하는 게 아니다. 주먹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없다. 날선 칼은 자르려는 것이고 자르다 보면 무뎌지는 게다. 날선 칼은 무딘 칼보다 항상 먼저 쓰이고, 먼저 무뎌진다. 세상의 이치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쥔 것에서 펴고, 잡고 다시 쥔다. 날이 서고 쓰이고 무뎌진다. 다시 날이 서야 쓰임이 생긴다. 재물을 모으는 것은 크게 쓰려는 것이다. 크게 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하면, 쌓는 수고만 낳고 도적을 키워 스스로 지키는 고생만 낳는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주먹에 든 재물이다. 주먹을 펴야 새로 잡을 수 있듯 공을 세우면 떠나야 새로운 공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도란 그렇게 물 흐르듯 사물의 흐름이 바뀌는 순서다. 쥐고 펴며 날이 서고 무뎌지고 높은 곳에서 낮

최고의 선은 선의 크기에 있지 않다. 아무리 작은 행위라도 선함을 잊지 않고 항상 실천할 때 그게 바로 최고의 선인 것이다. 그런 선은 물과 같다. 항상 먼저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한다.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내려와 저 아래 바다를 채운다. 내려오면서 산과 들의 나무와 곡식에 양분을 줘 열매를 맺고 향기를 나게 하지만, 물은 스스로의 공이라 하지 않는다. 꽃이 나무가 스스로 자랐다 하도록 한다. 그리고 물을 머물지 않고 저 아래 바다로 흐르길 멈추지 않는다. 흐르며 모든 빈 곳을 채운다. 웅덩이의 크고 작음을 나누지 않고 웅덩이가 세모이건 네모이건 가리지 않는다. 물은 그렇게 모두 채우고 채우고 나서야 다시 흐른다. 세상의 온갖 더러운 곳을 깨끗이 한다. 흙탕물이 되건 오염수가 되건 마다함이 없다. 바위를 만나면 싸우지 않고 피해 가지만, 결국 그 바위에 구멍을 내는 게 바로 물이다. 그렇게 흘러 흘러 채운 바다는 깊고 또 깊다. 그래서 우린 물은 항상 선하다하는 것이다. 세모 컵에 담기면 세모 컵 모양이 되고, 네모 컵에 담기면 네모 컵 모양이 되고 그렇게 모양은 수천 수만가지로 바뀌지만 물은 그 본질은 항상 변함이 없다. 항상 먼저 스스로 낮은 곳에 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