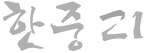중국 당국이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반간첩법'은 말 그대로 "마음 먹고 문제 삼으면 반드시 걸리는 법"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간첩 행위에 대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탓이다. 과거 대외비로 낙인 찍힌 정부 연구소의 간행물을 외국인에게 전했다는 이유로, 일부 대학 교수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분야까지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4월 26일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제공'을 추가했다.
또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 시설 등에 대한 촬영과 사이버 공격, 간첩 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추가했다.
아울러 간첩 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 겨냥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반간첩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됐다.
간첩 행위를 했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간첩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에 대한 당국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 권한이 법에 명시됐고, 간첩 혐의 사건에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를 부여했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은 '개정 반간첩법'이 교민 생활과 기업인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지난 26일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군사시설·주요 국가기관·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 행위,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 직접 촬영 행위,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등에 유의하라"고 공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