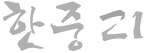무엇이든
극에 이르면
인간인 우리는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
극에 이른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인지 능력 밖에
있다는 의미인 탓이다.
지극한 기쁨도
지극한 행복도
지극한 고통도
지극한 슬픔도
실은
우리의 인지 영역
밖에 있는 것이다.
그것들은
마치
하나의 성체에서
발현된 수많은
객체들처럼
수억의 섬모처럼
서로가 서로에
반근착절(盤根錯節),
얽매여 있는지 모른다.
극도의 난마(亂麻)에
순간 우리는
놀라 소리치고
울고 싶어도
소리도
눈물도 잃고 만다.
바로 노자의
‘치극허’(致極虛)의 경지다.
극한의 기쁨에
극한의 고통에
극한의 슬픔에
맞아 우리는 우리 자체를 잊는다.
노자는 이 경지를
‘歿身不殆’(몰신불태: 몸을 잃어도 위험하지 않다)고 했다.
정말 그럴지,
치극허에 가보지 않은 탓에
잃어 본 적이 없는 탓에
무엇이
어떻게
위험하지 않은지 알 길은 없다.
사실 인생을 살며
극한 고통과 슬픔을 겪는 이 누구며,
극한 기쁨을 겪는 이 누군가?
과연 우리의 몇이나,
삶에서 감정의 극한에 이를까.
그저
감정들의 극한에 대한
숙념 속에
그저 그런가보다 할 뿐이다.
한자의 세계에서
기쁨의 경지는 고통과 닿았다.
지극(至極)의 끝은
또 다른 지극의 시작인 것이다.
대표적인 한자가 쾌(快)다.
심장을 긁어내는
기쁨의 쾌(快)는
고통의 이면이다.
극도의 슬픔은 무엇에 닿아 있을까?
한자 애(哀)은
죽은 자 없는 죽음이다.

금문에 등장하는 애(哀)는
옷 위에 놓인 입 구(口)다.
시체는 없이
사람의 옷 위에
덩그러니 입 구(口)가 놓여 있다.
바로 소리 없는
울음이다.
죽은 자의 옷 위에
떨어지는
눈물없는
곡성(哭聲)이다.
두보의
‘死别已吞声’(사별이탄성: 죽어 이별은 소리 없이 울고)의 경지다.
내지르는 탄성(歎聲)이
아니다.
삼키는 소리 탄성(呑聲)이다.
입 구(口)에는 두 가지
해설이 있다.
중국에서는 입 구(口)를
입을 본뜬 것이라 하고
일본에서는 입 구(口)가
주문(呪文)을 담은
제기(祭器)라고 한다.
어떤 것이든
슬플 애(哀)는
죽은 자의
옷 위에 남겨진
소리없는 말,
울음, 탄성(呑聲)이다.
혹 그 탄성은,
소리 없는 울음은
죽은 자의 것일 수 있다.
죽어 이미
소리 내지 못하지만
자신의 옷을
챙겨줄 친지에
지인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
이제
그를 기리는 기억들 속에 남아
영원히
변치 않을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