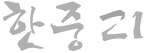유와 무가 생을 만들고,
길고 짧음이 모양을 만드는 게
세상의 이치다.
세상만물이 서로 하나면서
만물로 다른 이치기도 하다.
도리를 따르면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만 않고
쉬운 것을 쉽다다고만 않는다.
어려우니,
이제 쉬울 수 있고
쉬우니,
어려울 수 있는 때문이다.
하지만 이 도리를
따르기 어려우니,
그것은
쉬움은 어려움에 가려져 있고
어려움은 쉬움에 가려져 있는 탓이다.
짧은 것은 긴 것에 가려져 있고
긴 것은 짧은 것에 가려져 있다.
높고 낮음도
앞과 뒤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가리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렇게
당장
드러나는 하나만
본다.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을 알면,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은
있다 할 것인데,
아쉽게도
우리는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한다.
없는 게,
무(無)란
없는 게 아닌데,
우린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한다.
1과 0처럼
1다음의 0이 10이 되듯
유와 무는
유무로서로
새로운 단위의
존재가 된다.
0을 ‘없음’이란 값이
아니라
그저 ‘없다’고만
하면
그런 인식의
세상 속에는
‘1’은 언제나
‘1’일뿐이지, 10이나,
100이나, 1000은
있을 수가 없다.
만물이
유와 무로
이뤄지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게
바로
노자의 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