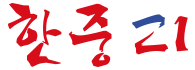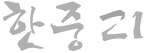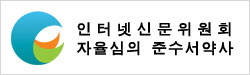백성 민은 노동계층이었다. 다스림의 대상이었지, 다스림의 주체가 아니었다.

우리 동양의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철인정치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철인은 스스로 나기도 하지만, 백성이 믿고 따를 때 만들어진다. 그런 믿음을 쌓아가는 게 우리 동양에서 '덕치'요, '선정'이었다.
이런 점에서 동양의 민주는 서양의 ‘democracy’와 차이가 있다. democracy를 ‘민주주의(民主主義)’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두 단어 어근의 의미는 사뭇 다르다.
영어의 ‘democracy’는 민중을 뜻하는 ‘demos’와 지배를 뜻하는 ‘kratos’가 결합된 단어다. 즉 대중,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현대적 의미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살폈듯 동양의 ‘민주’는 그렇지 않다. 옛 중국에서 ‘민주’는 ‘민의 주인’, 즉 군주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동양의 역사에서 백성 민은 스스로 군주를 저버리는 게 유일한 대안이었다. 산속에서 숨어 살거나, 산 속에서 뭉쳐 도적이 될 뿐이었다. 앞서 보았듯 백성 민은 노동자를 의미했다. 노동하지 않는 민은 더이상 민이 아니었다. 화적, 중국에서는 流氓liúmáng이라 불렸다.
결국 동양에서는 민의 개념은 맹자가 규정한 개념의 틀에 머물고 말았다.
여기서 한가지 짚고 가야할 게 있다. 민은 복수인가? 단수인가 하는 점이다. 동양에서는 추상화, 개념화 과정에서 현실의 복수를 단수화해 쓰는 경우가 많다. 한자의 특성이다.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흔히 쓰는 '대가'大家라는 표현이다. 대가는 우리 말로 '여러분'이라는 뜻의 복수를 의미하지만, 그 전체와 맞먹는 위대한 한 사람이란 뜻도 있다. '서양미술의 대가'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민이다. 그럼 민은 복수일까? 단수일까? 단어 의미는 '대가'처럼 복수와 단수를 모두 의미한다.
하지만 맹자가 규정한 민은 국민, 인민의 민, 복수의 의미다. 영어로 'people'이지 'individual'이 아니다. 이 전체 인민과 맞먹는 게 황제다. 그래서 황제, 지도자들은 항상 개별적인 민보다 옳은 것이다. 하나의 민을 위해서 다수의 민이 희생하는 건 누가 봐도 옳지 않기 때문이다.
이 복수와 단수의 문제는 단순한 듯 하지만 민주주의의 근본적 이해와 맞물려 있다. 개인주의적 민주냐, 전체주의적 민주냐는 문제는 오늘날 공산 독재를 하는 중국이 직면한 문제이고, 1900년대 초 동양에서 처음으로 서양의 문물을 가장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일본 지식인들의 고민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