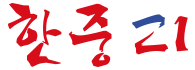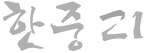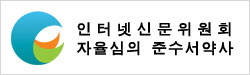“비판의 근거는 비판하는 사람들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실이냐, 아니냐에 있다.”
비지가부불이중과, 설재가비
(誹之可否不以衆寡, 說在可非)
즉, 많은 이들이 비판한다해서 그게 비난받을 일인 것이 아니라, 본디 옳고 그름은 옳으냐 그르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요즘 대중 민주주의 시대, 다시 한 번 되새겨볼만한 충언이다.
묵자가 경하(經下)에서 준 가르침이다.
먼저 ‘비誹’부터 보자, 비는 비판이라는 의미다. 남을 헐뜯는 것과 비판은 하나이면서 둘인 것이다.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잘못됐다 하는 게 바로 비판이다.
글 자형부터가 재미있다. 말을 하는 데 ‘아닌 것’, 즉 비(非)를 하는 것이 바로 비(誹 / 비방할 비)의 의미다. 이 한자는 뒤에 비판하다는 뜻 이상으로 헐뜯다는 의미가 강해졌다.
묵자는 이 한자를 쓰면서 뒤에 “가히 아니다”는 가비(可非)를 썼다. 자연스럽게 발음이 호응해 외우기 쉽고 말하기 좋다.
간단히 진정한 비판이라면 그 지적하는 이들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바가 사실이어야 한다는 게 묵자의 주장이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 언로가 자유로워지면서 세상에 옳고 그른 것보다 누가 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느냐가 중요해졌다.
유튜브란 게 만들어져 많은 이들이 보아주기만 하면 수익을 내게 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알려주기보다 누구편이 더 많은 가에 더 열을 올린다. 자연히 혹세무민하는 이들이 매일 늘어만 간다.
그럼 어찌 이를 구분할 것인가? 묵자의 ‘가비(可非)’에 답이 있다.
비판한 것이 음 정말 그러면 문제가 있네. 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 주는가가 중점이 되면 비방이 헐뜯기에 그치는 것인지, 그래도 정당한 비판이라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예컨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 반대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이 나라가 정말 이래서는 안된다는 충심에서 나온 것인지는 그 비판의 주장이, ‘어 정말 그럼 문제네’ 하는 것에 있는지 여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것은 현존하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분석한 것이어야지 거짓이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비지설,재가비(誹之說在可非)
뉴스의 대중화시대 다시 한 번 새겨볼 묵자의 가르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