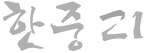무엇이 세계를 만들었을까?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
한자는 만물을 담은 글자다.
또 만물에 인간의 생각을 투영한 글자다. 상형자를 기본으로 발달한 한자야말로, 플라톤이 만든 이데아(본질)와 티마이오소(이데아의 모조) 관계 설정에 딱 어울린다.
한자는 이데아요, 티마이오소다. 둘 사이의 관계인 미메시스(모방)다.
한자는 사물의 모방에서 시작해
거꾸로 인간의 생각을 사물에 투영해내고 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무엇일까? 원천이요, 근원이다.
본래 점이지만, 한자는 좀 입체적이다.
점들의 모임, 연결된 하나, 바로 선이다. 수렴선이요, 기준이다.
한자의 일(一)이다. 일은 통계의 수렴선이다. 기준은 사물을 대표하는 것이며, 수렴되는 변화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공자의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일(一)이다. 만물을 관통하는 하나의 선, 그것은 위치도, 변화의 모양도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의 선일뿐이다.
5000년 전의 갑골문에서 오늘날까지 일(一)자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기준, 아니 수렴선이기 때문이다. 만물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일이 수렴선이요, 기준인 것은 인간의 한계 탓이다.
수렴선은 산포된 점들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요,
그것을 기준으로 산포된 점들의 차이를 구분하는 건 인간이다.
때론 수렴선의 변화가 중요하고,
수렴선을 기준으로 아래, 위의 거리가 중요하지만
우린 많은 경우,
그저 기준의 위만 보고
그저 기준의 아래만 본다.
그저 시작만 보고
그저 그 끝만 본다.
수렴선은 그저
가장 많은 산포된 점들의 모임, 특성일 뿐인데
그것을 모범이라 하고
다른 것을 배척하는 건 인간일 뿐이다.

한자 일(一)은 가장 단순한 글자지만, 이렇게 깊고 넓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산포된 점들의 수렴선이기 때문이다. 때론 세워 놓고 보고, 때론 눕혀 놓고도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