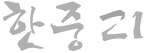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있다.
삶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다.
현명이라 함은 별다른 게 아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며, 귀로만 듣지 않을 때
그래서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듣을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것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바람 풍(風) 자가 전하는 지혜다.
바람 풍은 본래 상형자다.
상형자란 모양을 본 딴 글자다.
그런데 바람에 모양이 있던가?
도대체 선인은 무엇을 보고
바람 풍이라 했는가?
사실 이 질문 때문에서
바람 풍을 형성자라는 주장도 있다.
이해도 되고 일리도 있다.

본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래서 본 것만이 다이고
들은 것만이 다라는 주장도 있다.
틀리지만 않다.
다른 것이다. 세상을 보는 시각의 길이가
다른 것이다.
보는 이는 길고, 보지 못하는 이는
짧을 뿐이다.
장자의 봉황과 참새처럼
그렇게 둘은 세상을 살아간다.
보는 게 다르다고
세상 자체가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도 누군가는 본다.
바람 풍의 글자를 처음 쓴 누군가도
귀로 들을 것을, 얼굴에 스치는 감각을
눈으로 본 것이다.
바람이 요정을 본 것이다.
굳이 바람을 풍이라 한 것은
세상에 이런 긴 시각도 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세상에 갈수록 긴 시각이
줄어드는 세태 속에
혼자 생각해 본다.
긴 시각은 대체 현명하다.
인내롭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때문이다.
보지 못한 더 무엇인가가 있음을,
두려워하는 덕이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현실 속에
전령을 보내 자신의 존재를 알린다.
본래 가을은 낙엽으로,
겨울과 여름은 얼음과 긴 나무그늘로
자신을 보여준다.
새싹으로 봄이 자신을 드러내듯.
옛 동화 속 요정들이
바로 이 전령들이었다.
요정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건
요정 탓이 아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인간 탓이다. 세속 탓이다.
다시 그럼 도대체
바람의 요정은 무엇이었을까?

새였다. 갑골문에 등장하는 화려한 모습의 새였다.
새는 바람의 전령이다.
새의 나는 모습을 보면
바람의 방향을
바람의 강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바람 풍은 항상 묻는다.
‘네가 바람 보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이 있음을
네가 아느냐?’
바람을 보는 이는
때를 안다. 언제 돛을 올려야 하는지 안다.
그래서 저 먼 바다로 나갈 때를 안다.
“장풍파랑회유시, 직괘운범제창해”(長風破浪會有時, 直掛雲帆濟滄海; 거센 바람 파도를 가를 때가 오리니, 그 때 돛 높이 달고 단숨에 푸른 바다를 건너리.)
이백(701~762)의 싯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