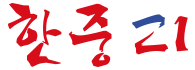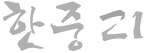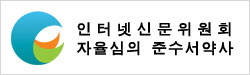중국에서 현대차는 희귀차다. 보기 드물다는 의미다. 삼성 갤럭시도 귀하다. 구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브랜드 모두 한국이 내놓은 세계적인 브랜드다.
심지어 삼성 갤럭시는 애플과 함께 세계 1위를 다투는 제품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중국에서는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일까?
중국 매체가 이 같은 현상을 분석하며, 첫째 중국의 기술 자립 수준 향상,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면서 중국 성장의 가장 큰 수혜를 받던 한국이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좀 ‘국뽕’ 반응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만은 없는 반응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 매체들이 분석한 한중 무역 통계에 따르면 무역 수지의 위치가 역전되었고, 30년 넘게 이어진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가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되었다.
32년 전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이후 첫 해를 제외하고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10억 달러(약 1조 3,200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31년 동안은 한국이 대중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의 대중 무역 흑자는 더욱 두드러졌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이 중국으로 더 많은 제품을 수출하여 더 큰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이전에는 확실히 제조업 강국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또한 중국과의 무역은 한국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한 거래처였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의 대중 수출 총액은 1,248억 3,500만 달러(약 164조 7,822억 원)였으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총액은 1,428억 4,900만 달러(약 188조 5,606억 원)에 달했다. 양자 비교 결과, 180억 달러(약 23조 7,6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지난해 무역 적자는 어떤 분야에서 발생했을까?30여 년 전, 중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을 때, 자동차부터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에 의존했다. 이러한 상황은 수년간 유지되었으며, 한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중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일단 대량의 가전제품은 이미 중국 내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심지어 수출까지 하고 있다.
자동차만이 아니다. 중국의 산업과 제조가능한 상업 제품군이 조밀해지면서 한국이 중국에 팔 제품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매년 많은 소비재 제조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해 크게 증가한 무역 적자는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필수 재료와 광물 제품을 수입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비교적 발달해 있으며, 배터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두 제조업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하는 곳이 바로 중국인 것이다.
지난해까지 만해도 한국은 중국에서 수입한 원재료를 반도체나 배터리로 만들어 되수출해 무역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완제품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고 동맹국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면서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도 지리적 긴장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는 게 특징이다.
반도체 산업만 보더라도, 미국의 견제와 봉쇄로 인해 중국은 사실상 전 산업 체인에서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벗어나고 있다. 이제 중국은 필요한 제품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심지어 점차 수출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제품은 더 이상 중국에서 매력을 잃게 되었다.자동차 외에도 한국 화장품과 한류 문화 역시 중국에서 서서히 퇴장하고 있다. 과거 여성들이 한국을 떠올리면, 성형이 먼저 떠오르고, 그로 인해 화장품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 드라마, 음악, 예능 프로그램 등 한국의 대중문화는 과거와 현재의 차이가 확연하다.
하지만 당장 화장품만 봐도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지 이었던 중국은 이제 한국의 최대 수입국으로 변하고 있다.
실제 2010년에는 한국의 대중 화장품 수출 증가율이 166.6%에 달했으며, 2014년과 2015년의 증가율도 각각 95.2%와 99.2%에 달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이러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했다. 그 해 한국의 대중 화장품 수출 증가율은 33%에 불과했으며, 2022년 이후 이 수치는 26% 이하로 떨어졌다.
반면 작년 상반기, 중국은 한국으로 화장품을 190% 더 많이 수출했다.
중국 매체들의 이 같은 분석에 중 네티즌들은 “이제는 한국은 중국에 아무 것도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무역 수지 변화보다 심각한 게 중국인들의 인식의 변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한중 양국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