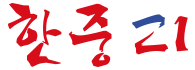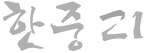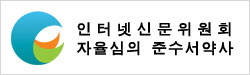예는 도가 사라진 세상에서 가장 높은 가치다. 노자는 도를, 공자는 예를 주장했다. 법가는 예가 성하지 않는 세상의 가장 큰 덕목이다.
도는 본래 이름이 없고, 정의(定義)가 없는 정의(正義)다.
그래서 어떻게 성하게 할지 인간의 문서로, 규약으로 정하기 어렵다. 도는 말로 전해지고, 행동으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서로 규정할 수 있는 상덕은 예에서 시작한다. 공자가 예를 중시한 이유다.

고대 예는 사람이 ‘혼인’에서 시작한다고 봤다. 혼례는 두 집안이 만나 새로운 집안을 형성하는 인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생산행위’다.
혼인이 있어야 아이를 낳고, 아이들은 커서 사회 생산을 이루는 가장 기본 단위가 된다.
고대 혼례는 ‘육례(六礼)’를 기본으로 했다. 훗날 주자는 이를 ‘삼례’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육례는 한 단계 한 단계가 혼례를 앞둔 남녀 두 집안의, 두 집안의 혼례를 바라보는 마을 주민의 관심사가 됐다.
집안의 규모가 크면 한 나라의 관심사가 됐다. 그래서 고대에는 “혼례는 부자를 친하게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육례는 납채(纳采), 문명(问名), 납길(纳吉), 납징(纳征), 청기(请期), 친영(亲迎)을 말한다. 납채(纳采)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혼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단계다. 이 때 반드시 매파를 세웠다. 매파를 세우는 행위는 여성의 집안을 존중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또 이 과정에서 결혼을 제안하는 성격의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지는 단계가 문명(问名)이다. 신부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확인하는 단계다. 신랑 측은 이를 통해 길흉을 점쳐 결혼의 적합성을 판단했다.
문명의 단계가 끝나면 납길(纳吉)의 단계다. 혼인 날짜와 시간에 대한 길조를 점친 후 결혼이 진행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단계다.
이어 납징(纳征) 단계다.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결혼 예물과 비용을 전달하는 단계다. 양가의 혼인 약속을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중요한 과정이다.
청기(请期):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양가가 합의하여 이를 확정하는 단계다. 사실 요즘은 문명에서 청기까지가 한 번에 이뤄진다. 양가가 결혼식 일자를 합의하고 예식장을 정하는 등의 행위를 이 때 하는 것이다.
이어지는 친영(亲迎)은 말 그대로 결혼식 행사날 이뤄지는 행위다. 신랑이 직접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실제 혼례식이 이루어졌다. 요즘으로 치면 예식장에서 아내를 받아들이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예는 복잡하지만 단계별 의도는 명확하다. 아내를 들이는 남성이 여성 집안을 존중하며 여성 집안의 의도를 매순간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시간이 지나며 허례허식이 흥하고 예의 본질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마치 불편함의 대명사처럼 변질 됐을 뿐이다. 예를 살리는 것은 예의 본질,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의 실현을 살려 실천하는 것이다.
법이 서야, 예가 흥하고, 예가 흥해야 도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