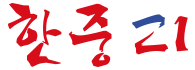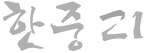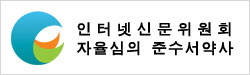중국 여러 왕조 중에 당나라는 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왕조로 꼽힌다.
수도인 장안성은 지금 발견되는 유적만으로도 100만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당대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1300여년 전 그 옛날 이 많은 인구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식량 문제까지 해결했던 것이 당왕조였다.
사람이 몰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문화도 발달하게 된다.

당 문인들은 지금도 중국 문화를 대표하는 이들이 많다. 이백과 두보는 중국 주변에서 한문학을 공유한 한국 일본은 물론, 서양인들까지 그 이름을 아는 중국 고대 시인들이다. 한 수 한 수의 시의와 시정이 여전히 현대인의 가슴을 울린다.

백거이는 맹호연, 왕유 등등 당시인 한 명, 한 명이 천의무봉의 명구를 지었고, 그 이름과 글을 천고에 남기고 있다.
그럼 이런 당시인들 중에 누가 오늘날까지 가장 많은 시가 보존돼 전승됐을까?
이백, 두보 중국 사람들은 물론 한국이나 일본까지 명성을 떨쳤던 이들이니 가장 많이 작품이 남지 않았을까?
사실 그 옛날 출판이 자유롭지 못했다. 그 시절 문집은 대부분 작가 스스로가 손수 써서 책을 만들어 남겨야 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 시가 좋다고 다 보존돼 전승됐던 것이 아니다. 두보나 이백보다 40년 정도 한 세대 뒤인 백거이(772~846) 시대 이미 이백의 수많은 시들이 ‘그런 시가 있었다.’는 정도만 전해지고 그 내용은 사라져 백거이는 “이백의 시 10구 중 하나만 전해지고 있다”고 한탄했을 정도다.
자 그럼 당왕조 그 많은 출중한 시인들 가운데 누구의 시가 가장 많이 전승이 될까? 답은 백거이다.
백거이는 앞서 언급했듯 이백의 시가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직접 체험한 인물이다. 스스로의 아끼는 시들이 그렇게 사라지는 게 두려웠다.
백거이는 이에 자신이 정리한 문집을 3곳의 주요 절에 보내 보관하도록 하는 방법을 썼다. 중국 속담에 ‘약은 토끼는 굴을 팔 때 3곳을 같이 판다’는 말이 있는 데 백거이가 정말 그렇게 자신의 문집을 3곳에 나눠 보관하도록 한 것이다.
중국 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백거이가 뤄양(洛陽)에서 은둔생활을 할 때, 그는 적어도 다섯 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집을 편찬했다고 한다. 약 835년 당시 64세의 백거이는 60권으로 된 약 2,964면의 시가 담긴 ‘백씨문집’을 편찬해 이듬해인 36년 루산 동린사에 보내 보관시켰다. 이어 839년 백거이는 다시 또 다른 판본인 ‘7질, 합67권, 약 3400수의 시’를 담은 편찬해 이번엔 수저우 남선사에 보관시켰다.
백거이는 또 842년 ‘백씨문집’ 후편 20권을 편집을 해 앞서 편집한 ‘백씨문집’ 전편과 함께 총 70권의 책을 다시 동린사에 보내 보관시켰다.
그 뒤 3년 뒤 백거이는 사망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쏟아 그의 앞 뒤 시집을 합쳐 총 75권으로 만든 최종 편집판을 엮는다. 이 최종본은 앞서 엮은 67권에 비해 353수의 시가 더 들어 있다. 백거이는 이 작품을 최종 종합판이라는 의미를 담아 ‘대집’이라 불렸고, 이듬해
휘창(胡昌) 5년, 사망 전날, 그는 앞뒤의 시집을 합쳐 75권으로 엮은 최종판(後臣話)을 완성했는데, 그의 최종판은 4년 동안 개봉한 67권보다 353권이 더 많았으며, "펜 한 자루의 크기, 3,840편의 시"였기 때문에 그는 이 작품을 "대모음집"이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마친 대문호는 1년의 세상의 마지막 휴식을 취한 뒤 영원한 안식에 든다.
총 3840편의 시를 올곧게 보관하려 한 노력은 그렇게 성공?
아니 사실 완전히 성공했다고 하기는 힘들다. 백거이 사후 당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서 그가 남긴 문집 원본, 백거이 필체를 담은 시들은 오늘날 완전히 소실됐기 때문이다.
백거이 노력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하지만 자신의 시 모두를 남겼다는 점에서 백거이는 분명 성공한 작가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문집을 집이 아닌, 대중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절에 보관했기 때문이다. 대중에게 문집을 개방하면서 백거이의 시를 좋아하는 많은 이들이 필사를 할 수 있었고, 이 필사본들이 강한 생명력으로 전승되면서 오늘날까지 백거이 시 전수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백거이 시를 읽다 보면, 문구 하나 하나를 아꼈던 시인의 마음도 전해지는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