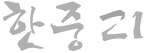외로움은
홀로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다.
문득
누군가 그리울 때
그 누군가가
몹시도
보고플 때
그 보고픈 이를
볼 수 없을 때
그 때
외로움은
검푸른 바다 밀물처럼
온 몸을
젖시어 온다.
그리움이
일상이 되면,
외로움도
일상이 된다.
일상이 된
외로움은
약도 없다.
그리운 이도
아직
나를
그리워한다는
믿음만이
외로움이
일상이 된
이를
버티게 할뿐이다.
그렇게 나온 싯구다.
“持此谢高鸟,因之传远情。”(지차사고조, 인지전원정)
“고마운 새야, 이 마음 전해다오”
당시인 장구령의 감우4수 중 3수다.
담담하지만
그래서 더 짙은 그리움이,
외로움이 묻어난다.
시정은 이렇다.
골목길 홀로 걸어
집에 들어와
마루에 걸터앉아
하늘을 보니,
저 높이 나는 새
“고마운 새야, 이 마음 전해주렴”
마치
저 노을이 내 마음과 같다.
누가 있어,
이 마음 알아나 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