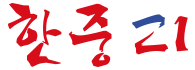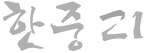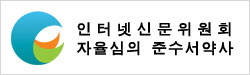중국에도 하이힐이 있었다?
중국에도 하이힐이 있었다. 청나라 만주족 이야기다. 청나라 만주족은 ‘화분저혜’(花盆底鞋)라는 중국판 하이힐이 있었다.
힐이 뒤꿈치에 있는 게 아니라 발바닥 중앙에 있는 게 다를 뿐이다.
중국 청나라 역사극에도 자주 등장을 한다. 발 중앙에 높다란 기둥이 있는 신발이다. 사실 형태만 보면 하이힐이라기보다 요즘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바닥 높은 운동화에 가깝다.
다만 기둥이 좁아 걷기 불편했을 뿐이다.
중국에서는 화분저혜를 ‘말발굽신’ 혹은 ‘꽃장식신’이라고도 한다. 말발굽처럼 신발 아래 받침을 댔다는 의미이고, 그 기둥부터 신발 자체를 꽃으로 장식한 경우가 많아서 나온 별칭이다.
불편한 이 신발은 왜 유행했을까?
먼저 화분저혜가 언제부터 유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청나라 복식은 지금도 남아 있는 청나라 복식 관련 문서들이나 귀족 여성들의 초상화를 통해 이뤄진다.
화분저혜는 아쉽게도 문서에서 그 유행시기를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한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초상화를 통해 알아볼 수밖에 없다.
화분저혜는 청나라 초기만 해도 이런 초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청 초기 황후의 초상화 속에는 화분저혜가 나오지 않는다. 즉 청나라 초기만해도 이 같은 불편한 화분저혜가 유행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화분저혜가 등장하는 것은 대략 청나라 중기 이후의 일이다.
그럼 그 때 화분저혜가 나왔을까? 그렇지는 않다. 관련해 3가지 유래설이 있다. 하나는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은 질퍽한 땅을 지나서 전쟁을 해 승리를 한 적이 있다. 그 때 질퍽한 땅을 편하게 지나기 위해 신발에 굽을 달았는데, 그 뒤로 만주족은 그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굽높은 신을 신었다고 한다. 그 신이 화분저혜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설은 만주족 여인들은 산에서 약물 등을 채취했는데, 이 때 바닥의 해로운 곤충을 피하기 위해서 굽 높은 신을 신었는데, 그 신이 화분저혜의 원형이라는 설이다.
두 설은 지금도 많이 언급되지만 정설로 받아들이기에는 설마다 해결하지 못하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우선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신었던 신이라면 왜 굳이 청나라 초기에는 등장하지 않고 중기이후 유행했냐는 것이다.
산 식물 채취를 위한 신이라는 설도 평지도 걷기 힘든 신을 신고 산을 올랐다는 설은 납득되지 않는 면이 있다.

마지막 설이 가장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분저혜는 어쨌든 만주족 전통 신발 가운데 하나인데, 그 것이 중국 전통의 전족문화를 만나 유행을 하게됐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여성들의 발이 작은 것을 좋아했다. 전족은 발을 끈으로 묶어서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중국 문헌에서는 송나라 때 이미 유행을 한 것으로 나온다. 작은 발로 뒤뚱뒤뚱 걷는 여성을 우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활기찬 만주족은 전족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청 초기에는 아예 전족을 황제 칙령으로 금하기도 했다.
하지만 본래 심미안이라는 게 유행을 쫓기 마련이다. 많은 이들이 좋다고 여기면 자연히 더 많은 이들이 좋다고 따르는 것이다.
만주족 역시 전족을 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작은 발로 우아하게 걷는 여성미를 남성은 물론 여성들 스스로가 좋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 결국 만주족은 전족을 하지 않고 우아하게 걷는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화분저혜를 신는 것이다. 화분저혜는 바닥에 힐을 대다 보니 키높이 신발의 역할도 했다. 서면 자연스럽게 여성의 몸매 곡선을 보여주는 치파오 속에서 여성 몸매의 비율을 보기 좋게 만들어 준다.
신발은 온갖 기둥에 각종 장식을 하면 옷 밖에서 보이는 것은 작고 아담하면서 화려한 기둥부분이다.
이 효과 때문에 청나라 후기에는 적지 않은 남성 귀족들도 이 화분저혜를 신었다고 한다. 화분저혜 어찌보면 중국 내륙의 전통적 미와 만주족의 실용적 미가 결합한 ‘융합의 미’인 셈이다. 본래 문화란 그런 것이 아닐까? 이 것과 저 것이 만나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게 진정한 문화의 흥망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