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것을 비교해 다른 것을 알아내는 게 차별의 차(差)다. 같은 곡물을 비교해 둘의 다름을 보는 모양이다. 갑골, 금문 등에 등장하는 구(區)는 오늘날의 글자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작은 물건들을 하나의 경계로 묶어낸 모습이다. 일부 글자는 한 선을 꿴 모습도 있다. 즉, 구별의 구는 공통점을 갖는 여러 물건을 한 데 묶은 모습이다. 자연스럽게 각각의 공통점이 다른 무리들이 만들어지는 데, 그 그룹과 또 다른 그룹의 다름이 구별(區別)이다. 바로 이점에서 차(差)와 구(區)는 완전히 다르다. 간단히 말해 출발이 다르다. 차는 같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는 다른 것에서 출발한다. 모두가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 혹 대표적 특징으로 묶이는 한 무리를 만드는 게 바로 구다. 구별은 그렇게 공통점과 특징으로 묶인 그룹 간에 이뤄지는 것이다. 차는 같은 것에서 떼어내는 것이고, 구는 다른 것을 하나로 묶는 것이다. 그래서 차별은 우리 가운데 있고, 구별은 너희 가운데 있다. 차별은 조직을 해치고 구별은 조직을 단합시킨다. 중요한 것은 차별이나 구별이나 그게 필요할 때만 한다는 것이다. 세상의 만물은 어찌 구별하면 하나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지구의 만물은 우주 속 또

참새는 목이 짧아 참새요, 황새는 목이 길어 황새다. 참새가 목이 길면 참새가 아니고, 황새가 목이 짧으면 황새가 아니다. 황새가 목이 길다고 자르면 살지 못하고 참새가 목이 짧다고 늘이면 역시 살지 못한다. 생물이 그렇다. 서로 다르다. 본래 그렇다. 같은 새라도 참새와 황새가 다르고, 사람이라도 너와 내가 다르고, 너의 그가 다르다. 세상 만물은 다르기에 서로 어울려 산다. 다르기에 조화가 생기고, 만물이 있어 생동이 있다. 다르다는 건 평소 눈에 띄지 않는다. 참새와 황새가 다르다는 걸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너와 내가 다르다는 걸 평소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 굳이 강조할 필요없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기에 달리 살고 달리 살기에 조화롭되, 간여하지 않는다. 다른 게 강조될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것만 빼고 같을 때다. 모든 게 같을 때 비로소 다름이 두드러진다. 모두가 같기에 굳이 차이(差異)를 찾는다. 차이(差異)의 차(差)라는 게 그렇다. 같은 것끼리 비교해 다른 것이다. 갑골자의 차(差)는 벼(禾) 가지 두 개를 든 손이다. 훗날 하나를 들고 기구로 재는 모습의 글자 형태도 나온다. 자로 벼의 크기를 재는 것이다. 같은 벼의 다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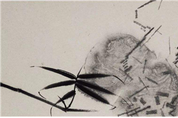
단장의 고사는 아기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이야기다. 아기 원숭이가 잡히자, 어미가 따라 오며 울다 울다 결국 죽고 말았는 데, 죽은 어미 원숭이의 그 가슴을 열어보니 너무 깊은 슬픔에 오장육부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는 이야기다. 짧지만 이처럼 혈육 간 이별을 표현한 글이 있을까. 그래서 나온 표현이 단장, 장이 끊어졌다는 말이다. 단장의 슬픔이 단장의 아픔이 바로 이별의 슬픔요 아픔인 것이다. 애달픈 것은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 아픈 이 슬픈 단장의 이별을 약속 받는다는 점이다. 그게 삶이다. 삶은 얻었다 잃는 것이다. 차면 기우는 달처럼 만났다 헤어지는 게 바로 우리네 삶이다. ‘매일 이별하며 살고 있구나’ 노랫말 그대로다. 우리는 매일 너무 살갑고 익숙한 너무도 사랑하는 오늘의 너와 너희와 이별하고 있다. 갑골자 별(別)은 이런 이별의 아픔을 하나 틀림없이 그려낸다. 뼈에 붙었던 살점을 칼로 뜯어내는 모습이다. 뼈에서 살이 떨어지는 아픔, 그게 바로 이별의 별이다. 단장의 고사, 이별의 아픔, 별(別)이라는 한자는 그렇게 담고 있는 것이다.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것, 내게서 너를 떼어내는 것, 그래서 너무도 아픈 것 아파서 잊을 수 없는 것 바로

세상은 존재(存在)로 채워져 있다. 세상(世上)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란 없다. 존재하기에 인식(認識)되는 것이다. 또 인식되지 않는 걸 아는 것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걸 우리는 인식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다. 우리는 감지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 길이 없다. 표현할 길이 없다. 존재하기에 있다하고 있지 않음을 알기에 없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와 무는 모두가 하나의 존재다. 유의 존재요, 무의 존재인 것이다. 갑골자에서 유(有)는 손안의 고기다. 본래 손 그 자체다. 있다는 것은 내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며 내 손에 들려지는 것이었다. 내 손에 없는 게 내 손에 있다가 없어진 게 바로 없는 것이었다. 무가 있어 유가 나오고 유가 있어 무가 나온 것이다. 있다하는 것도 없다하는 것도 없음도 있음도 모두가 세상에 존재하기에 느끼고 인지하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와 무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존재로서 모두가 하나인 것이다. 없다는 존재(存在)요, 있다는 존재인 것이다. 공(空)과 색(色)처럼 양(陽)과 음(陰)처럼 실(實)과 허(虛)처럼 하나의 존재들인 것이다. 비워진 것이 공이 채워지려 하고 채워진 색이 비워지려 하듯 뜨거운 양이 차가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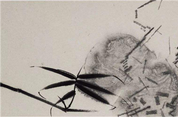
무는 없다는 것이다. 없다는 것은 어찌 알까? 한자를 그런 무(無)를 표시했다. 그것도 상형자다. 도대체 어떤 모습에서 없다는 것을 있지 않다는 것을 표시할 수 있었을까? 사실 없다는 것은 있는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아는 것이다. 있는 것들, 그 외 것이 바로 무(無)인 것이다. 있는 것을 빌어 없음을 아는 것이다. 사실 갑골자의 무(無)가 그렇다. 춤을 추는 모습이다. 춤을 추며 손에 든 것을 몸에 부착한 것을 모두 보여주는 게 바로 무(無)다. 춤이라는 의미의 무(舞)가 생기면서 없을 무(無)와 구분됐지만 없을 무(無)나 춤출 무(舞)나 본래 하나의 글자였다. 없다는 것은 있다는 것을 다 보여준 뒤야 비로소 알게 된다. 내 곁에 무엇이 없는지를 …. 갑골자 무는 그렇게 실제론 가차자다. 춤 무(舞)를 빌어 없을 (無)로 썼다. 있음을 빌어 없음을 표기한 것이다. “遥知兄弟登高处, 遍插茱萸少一人。” (요지형제등고처, 편차수유소일인) “저 멀리 형제들 산에 올랐겠지. 그리고 돌아가며 수유나무 가지를 머리에 꽂다 그 때 비로소 다시 알겠지. 내가 자리에 없음을 ….” 당나라 시인 왕유의 시 한 구절이다. 중양절 산에 올라 수유나무 가지를 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참 어려운 질문이다. 수많은 법전(法典), 종교 경전(經典)이 있어도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쉽지가 않다. 많은 이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실수를 한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서양 입장에선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 생긴 불행이다. 정말 그렇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곧고 굽음에 대한 판단은 사실 불행이다. 그래서 굳이 따져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있지만, 최대한 피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세상은 때론 몰라서, 구분하지 않아서 나은 게 있다. 아니 더 낫고 더 많다. 최소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선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게 역시 좋다. 그래도 따진다면 옳고 그른 것, 곧음과 굽음 둘 가운데 무엇을 따져야 할까. 사실 곧음은 하나다. 어찌 둘이 다 옳을까. 즉 따질 게 없다는 의미다. 굳이 따진다면 굽음이다. 얼마나 굽었는지, 따져봐야 안다. 한자 곧을 직(直)과 굽을 곡(曲)에는 이 같은 생각이 담겨 있다. 곧을 직은 눈에 보이는 하나요, 굽을 곡을 굽을 재는 자다. 눈금이 분명한 자다. 곧을 직은 덕(德)에 포함돼 있어 하나의 의미군(意味群)을 이룬다. 눈을 부릅뜨고 사거리를 걷는 모습이다. 일직선으로 가는 모습이다. 곧

땅이다. 무엇이 보이는가? 흙덩이? 돌덩이? 선인들이 본 것은 생명이다. 땅이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진정 귀한 게 바로 한 줌의 흙이다. 귀할 귀(貴)가 알려주는 진실이고, 땅 지(地)가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다. 땅은 생명이요, 가장 귀한 것이다. 땅 지(地)는 단순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관계학의 정수, 그 자체다. 하늘의 천, 땅의 지의 관계가 바로 자연, 본래 그런 것들이다. 갑골문이 아니라 금문에서 그 형태가 보인다. 글자 모양은 땅 위를 기어가는 벌레들이다. 벌레들은 자연 모든 생물의 기초다. 땅 속을 기어 땅을 숨 쉬게 하고, 숨 쉬는 땅은 그 속에 식물이 싹을 틔워 자라도록 한다. 식물이 자라는 땅에는 그 식물을 먹고 크는 동물이 모여들고 다시 그 동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모여든다. 벌레는 ‘땅의 풍요’의 상징인 것이다. ‘풍요의 순환’의 시작점인 것이다. 인간은 천지 사이에서 둘 관계의 긴장 속에 태어나 자라고 죽어가는 것이다. 부동산은 일찌감치 소중한 자산이었던 셈이다. 다만, 오늘날 부동산 자산과 비교해 선인들은 생명을 봤고, 요즘의 투기꾼들은 현금만 본다는 게 차이다. 땅을 생명으로 볼 때만 하늘의 도리가 보인다. 하늘의 도리는 ‘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객관적 답이 있고, 주관적 답이 있다. 객관적 답은 모두가 그렇다 하고 주관적 답은 내가 그렇다 하는 것이다. 모두가 선하다 하면, 객관적 답이고 내만 선하다 하면 주관적 답이다. 하지만 모두가 선하다는 게 오직 내게만은 악하다면 그게 선일까, 악일까? 간단히 내게 선하지 않은 게 모두에게 선하다는 게 가능하기는 한가. 세상의 주체는 ‘나’다. 세상의 선은 내게 선하는 데서 시작되고, 세상의 악은 내게 악한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최소한 갑골문을 만든 선인(先人)들은 그리 생각했다. 갑골문을 만든 선인들은 선을 입에서 찾았고, 악을 마음에서 찾았다. 선은 양을 보고 입맛을 다시는 모습이다. 갑골자에 양(羊) 아래 입 구(口)가 보인다. 악(惡)은 좀 복잡하다. 아(亞) 밑에 마음 심(心)이 있다. 아는 사방이 막힌 길이다. 사방 어느 곳에도 마음 둘 곳을 잃은 모습이 악(惡)의 본의다. 선은 입맛에 맞는 양고기요, 악은 갈 곳을 잃은 마음이다. 선인들은 “선함은 입에서 나오고 악함은 마음에 달렸다.” 고 본 것이다. 선과 악 모두가 자기 본연에서 나온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우린 선(善)과 위선(僞善)을 구분할

생각은 마음의 공간에 존재한다. 마음의 공간은 가슴, 심장에서 머리까지의 공간이다. 심장은 감성이며, 머리는 이성이다. 가슴에 남는 사람, 심장에 남는 사람은 감성으로 남는 사람이다. 정으로 이어진 사람의 관계다. 머리에 남는, 이성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계산적 관계로 맺어진 인연이다. 감성과 이성의 차이는 지구와 화성의 거리보다 길다. 고 신윤복 선생이 던진 명제다. 한자에서는 바로 인간의 생각을 말한다. 생각 사는 마음 심(심)에서 머리 정수리까지를 의미하는 글자다. 복잡한 개념이어서 갑골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금문에서 등장한다. 생각 사보다 일찍 나온, 마음의 소리인 뜻 의(意)자 있어, 생각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마음의 소리가 의지의 뜻이 강해지면서 생각 사가 필요해지지 않았나 싶다. 말이 있어 오해가 생기고 다시 오해를 풀려 말이 생기는 법이다. 글자도 마찬가지다. 한 글자가 생겨 풀이가 다양해지고 다시 글자가 나온다. 그래서 말과 글은 있는 게 없는 것만 못하다는 명제도 나왔다. 노자의 명제다. 무우유용(無于有用)이며, 당무유용(當無有用)이다. 감성에 치우친 이와 이성에 치우친 이의 거리는 지구와 화성의 거리보다 멀다.

밝음의 반대는 밝지 않은 것이요, 어둠의 반대는 어둡지 않는 것이다. 밝지 않은 것에는 어둠이 있고, 어둡지 않으면서 밝지도 않은 회색의 공간, 시간이 있다. 어둡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다. 음과 양도, 남과 여도 같다. 둘 사이의 공간, 구석의 공간은 항상 비어있으며 그것이 존재의 세상의 본질인지 모른다. 인(人)과 간(間)의 본질인지 모른다. 간(間)을 사는 게 인간이다. 가짜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자연이 던진 세상의 본질들 사이에 인간이 끼어 넣은 존재가 바로 가(假)다. 본래 뜻 가운데는 그래서 빌려주다는 뜻도 있었다고 한다. 가(假)는 개념이 복잡해서 금문에서 나온다. 금문의 상형은 구석을 사람 손으로 채우는 모습이다. 구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다. 혹자는 감옥이라 하고 혹자는 그저 구석이라 한다. 구석을 채우는 손길, 바로 가짜다. 자연과 달리 임시적이다. 그래서 동양의 가짜 가에는 일시적이란 의미도 공존한다. 자연의 시간에서 모든 인간은 일시적이다. 가짜인 것이다. 가짜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에겐 오히려 편리한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이 자연 속에서 오직 인간에게만 허락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인간은 스스로 가짜의 기술을 극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