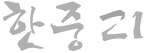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春风不相识, 何事入罗帏?”
(춘풍부상식, 하사입라위)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
애꿎은
치마 끝만
들추네.
시성 이백(701~762)의 춘사다. 이백은 누구라 말할 것 없는 천재 시인이다.
1300여년 전 당나라 시인이지만,
지금 읽어도 시의와 시정은
읽는 이의 마음을 적시고, 요동치게 한다.
그의 시어(詩語)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한계 속에 있지만,
그의 시율은 시대를 넘어
천고를 관통해 면면히 이어진다.
동서양, 그의 시처럼
때론 호방하고
때론 애처롭고
때론 정욕에 싸인 듯
때론 백합처럼
간결하고, 깨끗한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시를 본 적이 없다.
춘사(春思)는
말 그대로 ‘봄의 생각’이다.
봄에 드는
그리움이다.
하지만 겨우내
가슴 속 깊숙이
농 익어온
마음의 정, 심정(心情)이다.
본래 그리움이
짙어지면
애달프다.
애달프다는 건
마음만
아픈 게 아니다.
몸도
아픈 것이다.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그려,
그리다 못해
그대 오는 날
그만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는
단장(斷腸)의
고통,
애달픔이다.
춘사는 이 애달픔을 너무 간결하게
너무도 새침하게
너무도 요염하게 그렸다.
그래서
일견 소녀의 방심(芳心)같고
탕부의 음심(淫心)같으며,
때론 열부(烈婦)의 결의(決意)같다.
이백의 춘사요,
춘사의 의역시다.
燕草如碧絲 연초여벽사
秦桑低綠枝 진상저록지
當君懷歸日 당군회귀일
是妾斷腸時 시첩단장시
春風不相識 춘풍부상식
何事入羅幃 하사입나위
“남녘 나뭇가지
무성하고
북녘 풀도
푸르러졌는데
저 멀리
님은
이 애간장
다 태우고
오시려나.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
애꿎은
치마 끝만
들추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