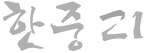“약할수록 더 힘든 세상
만사 촛불처럼 흔들리네.”
(世情惡衰歇,
萬事隨轉燭.)
세상이 참 그렇다.
약한 이만
찾아서 더 괴롭힌다.
인정이란 게 참 그렇다.
약하고
몰락한 이를
외면하게 된다.
가난해 보고
쇠약해 지면
비로소 세상의 본 얼굴이 보인다.
두보의 시 ‘가인’(佳人)다. 첫 구절만으로 시의 제목을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다. 시는 몰락한 가인이 겪는 세상사를 노래하고 있다.
시는 안록사의 난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난 758년 가을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해 6월 두보는 벼슬이 화주사공참군으로 강등되자, 벼슬을 버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터전을 진주로 옮긴다.
‘가인’은 그 때 쓰였다.
어떤 이는 두보가 그냥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것이라고 어떤 이는 실제 들은 것을 작품화했다고 주장한다. 누구도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당시 세태만은 사실이라는 게 중론이다.
두보는 이렇게 시로 세상을 고발한 저널리스트다. 시로 기사를 썼다.
시는 산 속에서 우연히 만난 가난하지만 귀품 있는 중년 여성을 만나면서 시작한다. 그 중년 부인을 지칭하는 말이 가인이다.
깊은 산 속 계곡에
가인이 살고 있네.
“난 귀족이었어요.
이젠 초목에 살죠.
지난번 난리통에
형제를 잃었어요.
귀족이면 뭐하나요?
수급도 못 챙겼는데.”
담담하지만 처참한 고백이다.
그리고
처음 소개한 구절이
마치
노래의 후렴구처럼 나온다.
“약할수록 더 힘든 세상
만사 촛불처럼 흔들리네.”
그리고 계곡에서의
불행한 삶에 대한 고백이 이어진다.
난리를 피해 산속에 숨어
지난날 보석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지만,
남편은 안정을 찾자마자
첩을 들이고,
가인을 나 몰라라 한다.
후렴구는 가인의 한탄이며
동시에 시로 세상에 남긴
두보의 한탄이다:
‘세상이 그런 것이다.
몰락한 귀족을 외면하고
나이든 여인을 외면하는
그렇게 촛불처럼
흔들리기만 하는
세상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나오는 시구가 절구다.
“산 속 맑은 샘물도
세속에선 탁해지네.”
(在山泉水淸; 재산천수청
出山泉水濁; 재산천수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