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하느냐? 그럼 참아라. 때를 기다리고, 네 능력이 다 차길 기다리고, 조건들이 성숙되길 기다려라. 그럼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걸 얻는다. 만고의 진리다. 노자의 진리이기도 하다. 나의 조건은 내게 있는 것이지만, 일의 조건의 내겐 없는 것이다. 내게 있는 것으로 다하고, 없는 것으로도 다하는 것, ‘위무위, 무불치’(爲無爲, 無不治: 있고, 없음으로 위함은 다스지 못함이 없다.) 의 경지다. 위함의 완성은 유위(有爲)와 무위(無爲)가 함께 만들어낸다.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위함’이 있어야 이뤄지는 것이다. 무위는 방치가 아니요, 포기는 더더욱 아니다. 무위는 너무나 위해서 위함마저 참는 것이다. ‘하지 않음으로서 위하는’ 단계다. 드러난 것만을 높이 세우지 말며, 감춰진 것들도 귀히 여길줄 알면, 삶이 본시 홀연히 있다가 없어지는 것임을, 삶이 본시 홀연히 이뤄졌다 흩어지는 것임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된다. 보라, 흩어지지도 않을 것은 본래 이뤄지지도 않음을! 보라, 있지도 않았을 것은 본래 사라지지도 않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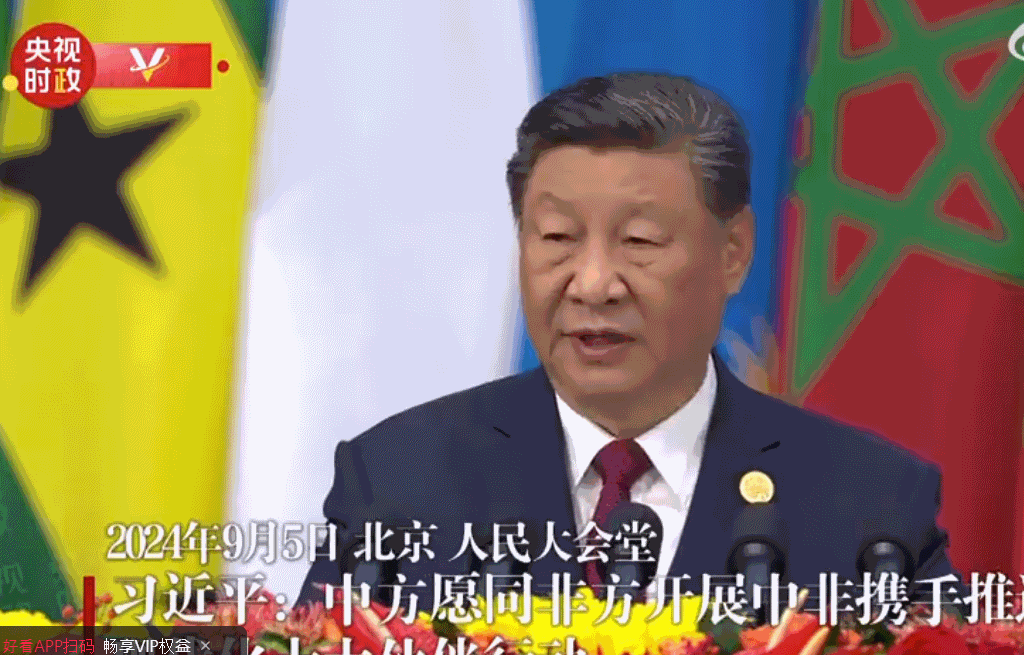
실제로 중국 경제도 힘들지만, 아프리카 각국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도 아프리카에 경제 공동체 건설에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 역시 이 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 이 사실은 중국의 아프리카 투자 현황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스턴 대학의 글로벌 개발 정책 센터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국영 정책 은행을 통해 아프리카에 전통적으로 대출한 금액이 2000년 약 1억 달러에서 2016년 288억 달러로 급증해 아프리카 최대의 양자 채권국이 됐다. 그러나 그 숫자는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하여 2022년에는 약 10억 달러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46억 달러로 증가에 그쳤다. 이 기간 중국은 단순 재정지원이 아닌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로 투자 형식을 추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블룸버그는 보고서는 니의 시만두 철광석 광산을 ‘공공-민간 파트너십’ 모델의 한 사례 꼽았다. 이 광산에는 중국 바오우 철강 그룹(China Baowu Iron and Steel Group)과 중국 알루미늄 코퍼레이션(Aluminum Corporation of China)이라는 두 회사가 광산의 40%를 통제하고 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중국 당국의 통제를 받는 국영기업들이다.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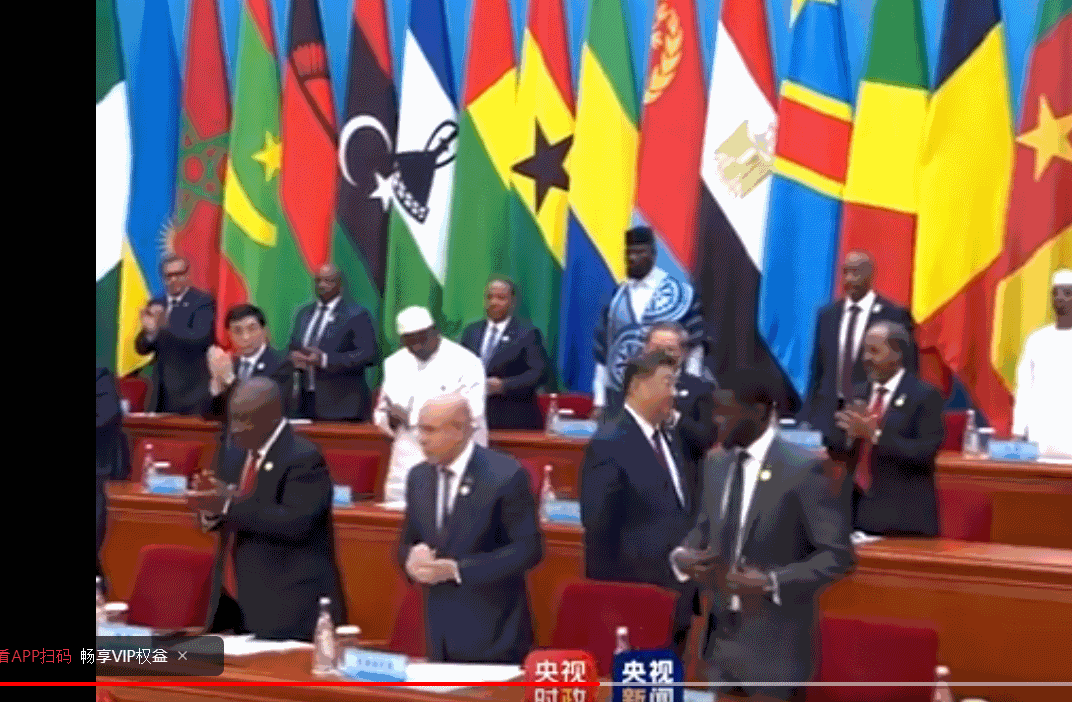
아프리카 경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를 게 국제사회 오랜 인식인 가운데 중국이 아프리카에 대해 68조 원가량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서방 매체들 사이에서 당장 나온 평이 “중국이 결국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이익을 택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중국의 선택은 후회만 남길 것이라는 늬앙스의 분석을 하고 있다. 당장 자국 경제도 어려우면서 성과 보장이 없는 아프리카 지원에 나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당장 중국이 얻고 잃는 것은 무엇일까? 장기적 관점에서 어떤 변수들이 중국 선택의 성패를 가를 것인가? ?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향후 3년간 아프리카 국가에 3,600억 위안(67조 9,752억 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 지원에는 차관 2,100억 위안, 각종 원조 800억 위안, 중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700억 위안이 포함된다. 서방의 주요 매체들은 시 주석의 정치적 도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상환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에게도 부담이고, 재정 지원의 상환조건이 나쁠 경우 향후 아프리카에게도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24년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FOCAC)이 4일 개막했다. 5일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은 일제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포럼 참석 아프리카 정상 20명과 개별 회담 소식을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아프리카 정상들과 한 방에서 만나는 것은 6년만에 처음이다. 미중 갈등 속에 미국과 서방 구도에 맞서 대안 세력 구축에 힘쓰고 있는 중국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포럼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서구 매체들 역시 오는 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 성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 주석은 3일 환영 만찬에서 축배를 들면서 '아프리카 친구들'과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인프라, 교육 및 기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내 철도망 건설 등 기존 성과를 내세우며 보다 긴밀한 경제 협력에 나설 계획이지만, 미국과 유럽 매체들은 “이미 아프리카 각국이 중국의 부채의 덫에 빠진 상황”이라며 “이미 일정 목표를 달성한 중국 역시 더 이상의 채무 불이행의 리스크를 안고 가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약속과 달리 중국과 아프리카 경제협력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성

삶의 여유는 '농'에서 나온다. 어렵고 힘들 때 불평이나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농담을 던질 때 우리의 삶은 여유롭고, 풍요로워 진다. 최소한 옛날에는 그랬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직접적이지 않게 애둘러 말했다. "이 놈의 세상, 의료개혁 같네. 뜻 대로 되는 게 없어!" 중국에서는 음력 7월 7일 칠석에는 고마운 사람을 찾아 식사를 대접하는 풍습이 있다. 옛날 중국 한 마을에 자린고비로 유명한 이가 살았다. 이 자리고비는 그래도 자녀 교육에는 돈을 써 주변에 유명한 학자를 물색해 아들의 스승으로 삼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칠석이 됐다.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불러 식사 대접을 했다. 스승도 이 자린고비가 불러주길 기다렸다. 그런데 웬걸? 이 자린고비는 칠석이 다가 와도 요지부동, 스승을 부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스승이 참지 못해 학생을 불러 넌즈시 물었다. "아버님이 식사는 언제 하자고 아무 말씀도 없으셨나?" 그제야 스승의 마음을 알아챈 학생이 아버지를 찾아 말했다.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 자린고비가 "허허"하고 웃으며 답했다. " 아니, 내가 깜박 실수를 했구나. 밥은 한 번 먹어야 하는 데 이미 칠석은 늦었고 오는 음력 8월 15일 중추절에

돈 싫은 사람은 없다. 돈을 벌기 싫거나, 관리하기 싫을 수 있어도 돈 자체가 싫은 사람은 없다.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한다. 돈이 많아 뭐든 풍족하게 다 갖는 이들이 부자다. 하지만 정말 그게 부자일까? 가진 게 많으면 그럼 정말 부자일까? 한국 제일의 부자 이병철 회장이 남긴 임종 전의 편지가 유명하다. 소위 ‘이병철의 24개 질문’이다. 하나같이 근본적인 질문이다. 쉽게 ‘우린 왜 사냐’는 질문들이다. 그중 부자에 대한 질문이 2개 있다. 하나는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는 “성경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을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에 비유했는데, 부자는 악인이란 말인가?” 24개 질문 중 15번째와 16번째 질문, 전자는 부귀 후자는 부자에 대한 질문이다. 사실 한자 세계의 답을 너무도 간단하다. 한자의 세계에서 부(富)는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한자의 세계에서 부(富)는 개인의 마음속에 있다. 어떻게 마음 속에 있을까? 한자 부(富)는 춘추전국 시대 등장한다. 갑골처럼, 동물의 뼈에 새겨진 아니라, 소위 청동기에 각인 돼 있다. 자형은 집 안에 술

외로움은 홀로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다. 문득 누군가 그리울 때 그 누군가가 몹시도 보고플 때 그 보고픈 이를 볼 수 없을 때 그 때 외로움은 검푸른 바다 밀물처럼 온 몸을 젖시어 온다. 그리움이 일상이 되면, 외로움도 일상이 된다. 일상이 된 외로움은 약도 없다. 그리운 이도 아직 나를 그리워한다는 믿음만이 외로움이 일상이 된 이를 버티게 할뿐이다. 그렇게 나온 싯구다. “持此谢高鸟,因之传远情。”(지차사고조, 인지전원정) “고마운 새야, 이 마음 전해다오” 당시인 장구령의 감우4수 중 3수다. 담담하지만 그래서 더 짙은 그리움이, 외로움이 묻어난다. 시정은 이렇다. 골목길 홀로 걸어 집에 들어와 마루에 걸터앉아 하늘을 보니, 저 높이 나는 새 “고마운 새야, 이 마음 전해주렴” 마치 저 노을이 내 마음과 같다. 누가 있어, 이 마음 알아나 줄까?

누가 있어, 돈 귀한 줄 모를까? 누가 있어, 금 좋은 걸 모를까? 귀한 건 세상이 먼저 안다. 그래서 쌓아놓은 금덩이는 도적을 부르고 쌓아놓은 곡식에는 쥐만 들끓는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귀한 게 뭔지, 알기는 하는 걸까? 그저 주변에 구하기 힘든 것 주변에 없는 그런 것들을 ‘귀하다’ 하는 건 아닐까? 심지어 주변에 없다고 착각하는 것들, 남부럽게 한다 착각하는 것을, ‘귀하다’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리 생각해보자. 하늘에서 이상한 권리증을 하나 받았다. 이 권리증을 제시만 하면, 내가 그냥 자동차 공장에 가서 차를 가져올 수 있고, 내가 그냥 어느 식당이든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런데도 돈이 귀하고, 금이 귀한 게 될까? 내가 은행에 가서 달라고 하면 은행원이 그 자리에서 그냥 인쇄를 해 돈을 주고, 내가 마트에 가서 달라고 하면 점원이 그 자리에서 그냥 뭐든 담아서 배달해 준다면, 내가 금은방에 가서 달라고 하면 주인이 금이든, 다이아몬드든 그냥 준다면, 돈이 귀하고, 금이 귀한 걸까? 실은 귀한 건 자동차요, 곡물이다. 정말 귀한 것은 인간의 제도 속에, 인간의 계약으로 인간의 약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나를 배부르게

지고 싶지 않지유?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고 싶네유? 그쥬? 서울대 법대도 못나오고, 사법고시도 보지 못한 것들에게 지고 싶지 않지유? 저 같지 않은 것들에게 지는 게 용납이 안되쥬? 그쥬? 법률에 다 나오는데, 법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이 잡 것은 도대체 왜 이러나 싶쥬? 그쥬? 멍~멍, 개소리유. 개소리라 한 마디 할게, 들어보슈. 쪼까 도움이 될테니. 다시 물어유. 세상이 참 거시, 뭐 쉽게 조c 같지유? 술 마시면 욕이, 욕이 막 나오쥬? 그지유? 아니유? 아님 말구유. 그런데 그럼 왜 그러유? 옛날 이런 일이 있었슈. 대감 집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이 무서워 도망을 가유. 도망을 가는데 이게 집안으로 자꾸 들어가는겨. 아니 집에 불이 났는데, 자꾸 안으로 들어가니, 어쩌유. 더 위험하지. 사람들이 소리를 쳐유. “아이야, 나와라! 나와라!” 그런디, 이 사람들이 어찌나 무섭게 소리를 치는지, 아이들이 더 겁을 먹은겨. 안으로 더 도망을 가쥬. 아이고 이걸 어쩌유. 그려유. 불 붙은 집으로 도망을 가니께, 사람들이 더 난리가 나, 더 무섭게 소리를 쳐유. “나오라니까. 너 죽을래?” 겁이 나니 아이들은 자꾸 더 뒷걸음 쳐유. 사람들은 더 소리 치

필리핀과 베트남의 대중정책이 극과 극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남중국해를 놓고 필리핀과 중국이 연일 물리적 충돌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반해, 베트남의 신임 총서기 겸 국가 주석은 취임과 동시 중국을 찾아 교류수준을 한 층 더 높이고 나섰다. 외신들은 중국을 놓고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양국의 선택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일단 서구 입장에서는 중국과 갈등을 빚으며 미국과 서구와 공동보조를 맞추는 필리핀의 선택에 더 점수를 주는 상황이다.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토람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베트남 국가주석이 이번 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지난 8월 1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베트남 정부는 성명을 통해 토람 총리가 방문 중 교통 발전을 위해 중국으로부터 연성 차관과 기술 지원을 모색하는 것을 언급했으며 중국과 국방 및 안보 관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과 베트남은 회담 이후 14건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그 중 양국 간 국경을 넘는 철도 건설을 촉진하는 내용이 주요 초점이 됐다. 시 주석은 토람 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은 항상 베트남을 주변 외교의 우선순위"로 여겨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