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망하라’ 그게 사는 게다. 그게 활(活)이다. 침 흘리는 게다. 하지만 사는 건 그게 다가 아니다. 욕망만 해서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욕망만 해서는 사는 게 텅 비워진다. 욕망은 비워지는 것이다. 배고픈 것이다. 욕망하되 채우는 것 그게 바로 사는 게다. 욕망으로 비워진 속을 채우는 것 고픈 배를 채우는 것 바로 삶이다. 욕망하고 채우는 것 그게 삶이다. 잘 욕망하고 잘 채우는 것 그게 잘 사는 길이다. 욕망을 채우는 것 바로 만족이다. 만족(滿足), 만 개의 다리다. 천수관음의 손 같은 만 개의 다리다. 천수관음의 손처럼 가득 채움의 또 다른 표현이다. 족(足)은 다리요, 채움이다. 족은 일찌감치 갑골자에 등장한다. 여러 모습이다. 하지만 모두 누가 봐도 다리다. 다리에서 ‘걷다’는 뜻이 나왔고, ‘채우다’는 뜻이 나왔다. 만족(滿足)이란 뜻의 족(足)은 노자에서 등장한다. 비움과 채움의 철학이 바로 노자의 철학이다. 만족의 등장은 너무 당연해 보인다. 노자는 “祸莫大于不知足”(화막대우부지족) “만족을 모르는 만큼 화가 온다” 했다. 만족과 그침을 같은 뜻으로 쓴 이가 바로 노자다. 장자는 족을 부유하다는 뜻까지 확장해 썼다. 그렇게 족은 욕망의

멍! 잘 지냈쥬? 독고여유, 오랜만유. 너무 쉬었다고유? 어디 개가 글 쓰는 게 쉽남유. 뭘 그리 서둘러유. 진득히 기둘리지. 오늘 왔잖유. 왔음 된거유. 오늘 이야기도 참 황당혀유. 중국이 본래 그래유. 덩치는 크고 쪼잔햐, 아주 쪼잔햐. 뭔 이야기냐? 아 거시지, 좀 기달리슈. 바람을 충분히 잡아야 더 재미도 있는 법이유. 중국에 리자치라는 남자 아이가 있슈. 아, 1992년생으로 29살인께 아이는 아녀유. 청년인감? 뭐 나이 좀 먹었슈. 이 얼굴이유. 잘 생겼쥬? 립스틱도 바르고. 영국 BBC뉴스 캡처 사진이유.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인물이유. 왕후, 아 그렇지 왕홍, 왕홍이라쥬. 타오바오 팔로어만 6400만 명이라 하네유. ‘라방’(라이브 방송) 틀고 물건 소개만 했다 하면 대박으로 팔린다고 혀유. 립스틱 보이쥬? 그 립스틱을 소개해 팔았는데, 단 5분 만에 1만5000개를 팔았다네유. 그래 붙은 별명이 ‘립스틱 다거’라네유. 다거는 ‘두목, 맏형’ 이런 뜻인거 알쥬?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라방’ 중 사라졌슈. 정말 ‘퓽’ 하고 사라진거유. 뭔소리라뉴? 정말 방송이 갑자기 중단되고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거유. 아 물론,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을

중국과 서방국가 간의 충돌이 심상치 않다. 미국과 갈등에 이어 중국이 호주와 캐나다와는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공에서 전투기와 초계기 간에 벌어진 일이다. 주목되는 건 두 가지다. 중국이 자국이 설정한 군사적 경계선, 하늘과 바다의 선을 물리력을 동원해 지키려 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주변국들과 물리적 충돌이 갈수록 빈번해진다는 점이다. 흔히 뺨 때리기 게임이 있다. 서로 사이 좋은 두 사람이 게임 삼아 서로의 뺨을 때린다. 처음 가볍게 볼을 터치하듯 시작하지만 강도는 저절로 세지게 된다. 누군가 먼저 상대방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도의 타격을 줬고, 상대가 이에 반응하면서 강도는 저절로 세지는 것이다. 마침내 둘은 얼굴을 붉히며 싸우게 된다. 물리적 충돌을 주고 받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명확한 사인이다. 멈추지 않으면 전쟁이 벌어진다. 물리적 갈등은 중국과 호주, 중국과 캐나다 간 벌어지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의 뒤에는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이 버티고 있다. 호주 국방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 전투기가 5월 26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호주 초계기에 초근접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단순히 근접 비행만 한 것

누가 처음에 마음을 봤을까? 호기심이었을까? 사이오패스의 살의(殺意)였을까? 누군가는 사람의 가슴을 갈랐고, 손을 집어넣어 마음이 있을 법한 곳의 장기를 꺼내 들었다.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삶의 시작이고 죽음의 시작인 곳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 그 곳에 있는 핏물 흐르는 장기 심장을 꺼내 들었다. 문자 마음 심(心)은 해부학이다. 추상의 실체를 보여준다. 심방과 심실을 마치 사진처럼 사실로 그렸다. 일본의 시라카와 시즈카 교수처럼 마음 심(心)자를 제물로 사람을 바치던 잔재라 보는 이들도 있다. 생각은 머리에 있고 느낌은 가슴에 있다 믿었던 시대 사람의 심장은 인간적 인식의 근원이었다.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느끼라” 는 말은 이런 생각에서 나왔다. 마음은 하나요, 백이다. 하나같은 백요, 백 같은 하나다. 하나인 듯 백이고, 백인 듯 하나다. 그래서 ‘一切唯心造’(일체유심조: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 ‘일이관지’(一以貫之: 하나로 꿰뚫는다.) 라 했고, 나아가 ‘관조’(觀照: 비춰봄)의 경지로 모아졌고 모든 게 마음에 달렸다. 양명의 심학(心學)으로 다시 풀어졌다. 인식되지 않는 세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모든 게 결국 마음에 달렸다.

사는 게 뭐냐 물으신다면, 시집의 제목이다. 누구누구 시인들이 비슷한 시를 썼다. 사는 게 뭐냐 물으신다면, 철학의 주제이다. 누구누구 철학자가 한 움큼 글을 썼다. 사는 게 뭐냐, 그리도 모두가 그리도 되묻는 질문이다. 도대체 사는 건 무엇일까. 사는 건 가장 저속하고 가장 더러운 사는 건 그런 저속하고 그렇게 더러운 것이며, 그런 것들과 함께 같이 하는 것인지 모른다. 사람은 누구나 뱃속에 똥을 담고 산다. 아무리 몸을 닦아도 뱃속의 똥은 남는다. 살아 있다는 건, 그렇게 뱃속 가득 똥을 담고 있는 것이다. 살아 있다는 것은 신진대사를 한다는 것이고 뱃속에 똥이 더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더럽지 않으면 산 게 아니다.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가까이 할수록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게 보이는 법이다. 가까이 갈수록 못된 점이, 단점이 보이는 게 사람이다. 진정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건 바로 그런 똥 냄새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참고 견디다 그 냄새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다. 마치 초(醜)두부, 된장처럼 심지어 과일의 여왕이라는 두리안처럼 처음엔 고약한 냄새로 괴로워하다가 맛을 들여, 나중에는 냄새만 맡아도 침을 흘리는 게 바로 누구를 좋아하고 누

한자는 사람에게 “그저 살으라”라고만 한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누군가 저 강의 달을 처음 본 뒤 강물처럼 흘러간 수많은 인간들이 던진 질문이다. ‘인간, 너는 누구냐?’ ‘인간, 나는 도대체 누구냐?’ 또 강물처럼 흘러간 수많은 인간들이 수많은 답을 남겼다. 남긴 답이 런던 국립도서관 철학 서고를 전부 채우고도 남는다. 아직도 그 답을 하는 책이 교보문고에 등장을 한다. 답에 대한 해설서도, 답에 대한 평가서도 줄줄이 나왔다. 보다 정교한 답을 위해 질문도 ‘인간의 사유란 무엇인가?’ ‘삶과 죽음이란 무엇인가?’ … 등등으로 수없이 쪼개지고 나뉘어졌다. 그 답들도, 그 답에 대한 답들도 산을 이룬다. 사실 한자로 치면 사람 인(人)자보다 단순한 게 없다. 하나 일(一) 다음으로 쉽다. 둘 이(二)만큼 쉽다. 왼쪽, 오른쪽 단 두 획이면 인(人)자 하나가 써진다. 너무 쉬워서 수많은 서예가들을 곤란하게 한 게 바로 사람 인(人)자다. 예쁘게 쓰기 어렵고 크게 쓰기 어렵다. 잘 쓰기 어려운 것은 그 쉬운 글에 너무도 복잡한 사람 인(人)의 일생이 담긴 때문이다. 그래서 오른쪽 획은 인의 품(品)이요, 왼쪽 획은 인의 격(格)이라 했다. 일생일세, 평생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것 그래서 목마른 자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다스림이다. 세상이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니다. 바로 물이다. 갈증을 풀어줄 물이다. 그게 진정한 다스림이다. 한자 그대로의 의미다. 다스릴 치(治)는 갑골자는 없다. 금문에서야 등장한다. 흐르는 물가에 사람이 입을 열고 기뻐하는 모습이다. ‘厶’는 ‘스’ 또는 ‘모우’라 읽는다. 갑골자 기호다. 본래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상징했다. 결혼해 부부만 나누는 것을 의미했다. 훗날 공동체 농사를 지어서 개인이 갖는 몫이란 의미가 더해졌다. 화(禾)를 더해 사(私)가 됐다. ‘厶’는 개인, 개인의 이익 개인의 즐거움이란 뜻이다. 그 아래 있는 게 입 구(口)다. 만족의 입, 웃음의 입이다. 물 가 옆의 태(台) 역시 금문에 등장한다. 금문에서 의미는 위의 풀이처럼 기쁘다는 뜻이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만났으니 어찌 기쁘지 않을까? 갑골문의 요순(堯舜) 시대만 해도 평등의 사회였는지 모른다. 임금은 봉사자였지, 군림자(君臨者)가 아니었다. 곳간지기가 귀족이 되고 그 귀족이 왕이 됐다. 왕들 사이에 황제가 나왔다. 하지만 백성은 여전히 백성이고 목마른 자다. 귀족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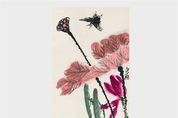
‘바르다’ 곧다, 밝다는 의미다. 그런데 곧고 밝은 게 무엇일까? 다른 질문이 아니다. 간단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이기도 하다. 문제는 간단한데, 답은 쉽지 않다. 누구는 이 질문에 책을 한 권 썼다. 곧고 밝은 것, 자연 현상이라면 쉽지만 사람의 일이라 설명이 쉽지 않다. 사람의 일 가운데 무엇이 곧고 밝은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곧고 밝은 걸 아는가? 역시 책 한 권은 나올 질문이다 싶다. 그런데 갑골문의 해설은 쉽다. 간결하고 명료하다. 갑골문에서 바를 정(正)은 어느 점을 향해 나아간 발의 모습이다. 점이 보이고 아래 발이 보인다. 간결한 선으로 너무도 분명히 발을 표현했다. 왜 발일까? 축구 선수나 농구 선수를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두 선수 모두 경기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속여야 할 때가 있다. 이 때 몸을 틀기도 하고, 시선을 돌려 보는 시늉으로 상대방에게 나아갈 바, 나아갈 곳을 속인다. 하지만 정말 속이지 못하는 게 있다. 발이다. 발은 앞으로 향하면 그 곳이 앞이다. 뒷걸음질을 하지 않는 한, 발은 사람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딘지 정확히 보여준다. 발이 마주 보는 곳이 앞이다. 정면(正面)이다. 몸을 비틀

약하디 약한 게 물이다. 둥근 바가지에 담그면 둥근 그대로, 각진 바가지에 담그면 각진 그대로. 그렇게 순응하며 사는 게 물이다. 한 바가지 물은 아차, 실수로 바닥에 흘리기만 해도 순식간에 조각나 흩어져 땅 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설사 고였다 해도 순식간에 바닥에 붙어서 다시는 쓸 수 없게 된다. 물은 그렇게 약하디 약하기만 하다. 그렇게 약한 물은 더러움을 가리지 않는다. 촛불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약하디 약한 물은 자신을 더럽혀 더러움을 정화시킨다. 물은 아래를 먼저 채운다. 아래로 아래로 흘러 맨 아래를 먼저 채운다. 아래로 흐를 때 물은 접하는 모든 빈 웅덩이를 채운다. 다 채워야 다시 흐른다. 아래로 흐를 때 물은 그 웅덩이의 크기를 가리지 않는다. 크건 작건 물은 웅덩이를 채워야 아래로 흐른다. 그렇게 아래로 흐른 물은 개울을 만들고 지류를 만들고 호수를 만들고 장강을 만들어 마침내 저 거대한 바다를 만는다. 바다는 흘러든 물을 개울이라고, 장강이라고, 차별하지 않는다. 바다가 된 물은 이제 더 이상 약하지 않다. 거대한 파도는 순식간에 저 63빌딩 높이로 치솟아 인간이 감탄하며 만든 거대한 배를, 심지어 땅 위의 거대한 건축물을 삼키어

‘道外無物’ (도외무물: 도 밖에 사물이 없다.) 도가가 전한 진리다. 간단히 ‘道中萬物’ (도중만물: 만물이 도 속에 있다) 이라는 의미다. 도가 있어야 만물이 있다는 뜻이다. 말은 쉬운데, 뜻은 어렵다. 그럼 도란 무엇인가? 사물을 담았다 하니, 도란 사물의 존재, 그 존재의 현존이다. 사물이 도요, 도가 사물이다. 사물을 알면 도를 아는 것이요, 역으로 도를 알면 사물을, 그 존재의 현존을 안다. 하지만 존재란 무엇인가? 다시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한, 존재를 현존케 한 도란 도대체 무엇인가? 꼬리를 물며 질문에 질문만 남는다. 도란 인간에게 주어진 난제다. 그 난제의 총체인지도 모른다. 저잣거리 만물이 북적이듯 도란 그런 혼돈 카오스의 법칙인지 모른다. 복잡한 개념이지만 정작 한자의 원형은 쉽다. 도(道)는 금문에서 보인다. 손에 고기를 들고 큰 거리를 걷는 모습이다. 마치 제사장이 제례 행렬을 이끌고 제사를 지내러 가는 듯싶다. 길은 큰 길이요, 행렬은 장엄하다. 고대 전쟁을 앞두고 점을 쳐 승패를 가늠했고 실제 승리를 하면 감사의 제(祭), 승리의 제를 지냈다.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들고 큰 길을 또박또박 걸으면 우리 편은 환호를 하며 길을 열고